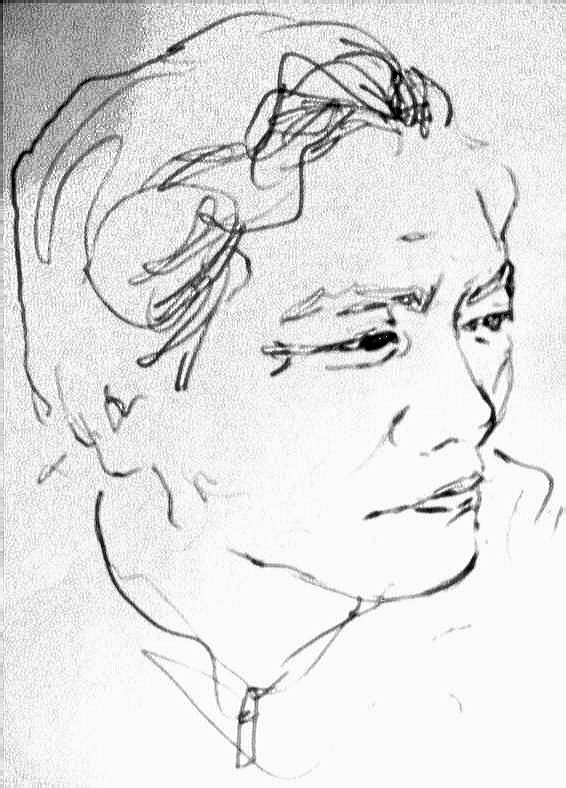
мҳҲмҲҳлҠ” вҖҳлҲ„к°ҖліөмқҢвҖҷм—җм„ң вҖңк°ҖлӮңн•ң мһҗм—җкІҢ ліөмқҙ мһҲлӮҳлӢҲвҖқлқјкі л§җн–ҲлӢӨ. м •л§җ к·ёлҹҙк№Ң?
лӮҳлҠ” м–ҙлҰҙ м Ғм—җ к°ҖлӮңмқҙ л„Ҳл¬ҙлӮҳ мӢ«м—ҲлӢӨ. м…Ӣ집мқ„ м „м „н•ҳл©° мЈјмқём§‘мқҳ лҲҲм№ҳлҘј ліҙлҠ” кІҢ м–јл§ҲлӮҳ кі лҗң мқјмқёк°Җ! мӢқмӮ¬лҠ” н•ӯмғҒ л¶ҖмӢӨн–ҲлӢӨ. м–ҙлЁёлӢҲлҠ” лӮЁмқҳ л°ӯм—җ к°Җм„ң 배춧мһҺмқ„ мЈјмӣҢ мҳӨм…”м„ң л¬јмқ„ 듬лҝҚ л„Јкі мҢҖмқ„ мЎ°кёҲ л„Јм–ҙ л©Җкұҙ вҖҳк°ұмӢқмқҙвҖҷлқјлҠ” мЈҪмқ„ лҒ“мҳҖлӢӨ.
н•ҷкөҗм—җм„ңлҠ” кё°м„ұнҡҢ비лҘј лӮҙм§Җ лӘ»н•ҙ мҲҳмӢңлЎң көҗл¬ҙмӢӨлЎң л¶Ҳл Өк°”лӢӨ. л¬ҙлҰҺмқ„ кҝҮкі м•үм•„ м„қкі лҢҖмЈ„(еёӯи—Ғеҫ…зҪӘ)н•ҳлӢӨк°Җ 집мңјлЎң м«“кІЁлӮ¬лӢӨ. м–ҙлҰ°м•„мқҙлҠ” кёҙ мӢ мһ‘лЎңлҘј н„°лҚңн„°лҚң кұёмңјл©° л¬ҙмҠЁ мғқк°Ғмқ„ н–ҲкІ лҠ”к°Җ? м§ҖкёҲлҸ„ к·ёл•ҢлҘј мғқк°Ғн•ҳл©ҙ мҲЁмқҙ л§үнҳҖмҳЁлӢӨ.
분лӘ… к°ҖлӮңмқҖ ліөмқҙ м•„лӢҲлӢӨ. н•ҳм§Җл§Ң мқҙ ліөмқ„ мІңліө(еӨ©зҰҸ), н•ҳлҠҳмқҙ лӮҙл ӨмЈјлҠ” ліөмңјлЎң л°”кҫёл©ҙ м–ҙл–»кІҢ лҗ к№Ң? н•ҳлҠҳ(мӢ )мқҙ лӮҙл ӨмЈјлҠ” ліөмқҖ мөңкі мқҳ ліөмқј кІғмқҙлӢӨ. м„ёмҶҚм Ғмқё ліөмқ„ л„ҳм–ҙм„ңлҠ” н•ңлҹүм—ҶлҠ” ліөмқј кІғмқҙлӢӨ.
мқёк°„мқҖ мңЎмІҙмҷҖ л§ҲмқҢ(мҳҒнҳј)мңјлЎң мқҙлЈЁм–ҙм ё мһҲлӢӨ. к·ё л‘ҳмқҖ н•ҳлӮҳмқёлҚ°, мҡ°лҰ¬ лҲҲм—җлҠ” л‘ҳлЎң лӮҳлүҳм–ҙ ліҙмқёлӢӨ. мҡ°лҰ¬ лҲҲм—җлҠ” мңЎмІҙл§Ң ліҙмқҙлӢҲ, мңЎмІҙм Ғ ліөмқҙ ліөмқҳ м „л¶ҖлқјлҠ” мғқк°Ғмқҙ л“ лӢӨ. к·ёлһҳм„ң мңЎмІҙм Ғ м•ҲлқҪмқҙ мөңкі мқҳ ліөмңјлЎң ліҙмқј кІғмқҙлӢӨ.
н•ҳм§Җл§Ң мҡ°лҰ¬лҠ” кІҪн—ҳн•ңлӢӨ. мңЎмІҙм Ғ м•ҲлқҪл§ҢмңјлЎңлҠ” л¬ҙм–ёк°Җ л¶ҖмЎұн•ң лҠҗлӮҢмқҙ л“ лӢӨ. м•ҲлқҪн•ҳкІҢ мӮҙкІҢ лҗҳл©ҙ мҡ°мҡёкіј к¶Ңнғңк°Җ мҳЁлӢӨ. к·ёлһҳм„ң л°”мҒҳкІҢ мӮҙм•„к°Җм§Җл§Ң, к№ҠмқҖ л§ҲмқҢмҶҚм—җм„ңлҠ” мӮ¶мқҳ кіөн—Ҳк°җмқҙ л°Җл ӨмҳЁлӢӨ. вҖҳмқёмғқмқҖ лӢӨ к·ёлҹ° кұ°м•ј!вҖҷ мӨ‘м–јкұ°лҰ¬л©° н•ҳлЈЁн•ҳлЈЁ л¬ҙмӮ¬нһҲ... н•ҳлЈЁмӮҙмқҙлЎң мӮҙм•„к°„лӢӨ.
мҡ°лҰ¬мқҳ л§ҲмқҢ к№ҠмқҖ кіімқҳ мҳҒнҳјмқҖ мҶҢлҰ¬м№ңлӢӨ. вҖҳмқёмғқмқҖ мқҙкІҢ лӢӨк°Җ м•„лӢҲм•ј! лҚ” лӮҳмқҖ мӮ¶мқҙ мһҲм–ҙ!вҖҷ мқҙ мҶҢлҰ¬лҘј м№ҳлҠ” мҳҒнҳјмқҙ мҡ°лҰ¬ м•Ҳм—җ мһҲлӢӨ. мқҙ мҳҒнҳјмқҖ мҡ°лҰ¬мқҳ мңЎмІҙк°Җ м•Ҫн•ҙ진 л§ҢнҒј к№Ём–ҙлӮңлӢӨ.
лҲҲмқ„ мһғмңјл©ҙ мҳҒнҳјмқҳ лҲҲмқҙ к№Ём–ҙлӮңлӢӨ. мҳҒнҳјмқҳ ліөмқҙ мІңліөмқҙлӢӨ. лӮҳлҠ” 30лҢҖм—җ л“Өм–ҙм„ңл©° мқҙ мҳҒнҳјмқҳ лҲҲмқ„ м–ҙл ҙн’Ӣмқҙ лҠҗлҒјкё° мӢңмһ‘н–ҲлӢӨ. вҖҳмқҙл ҮкІҢ мӮҙ мҲҳлҠ” м—Ҷм–ҙ!вҖҷ кі л¬јкі л¬ј кё°м–ҙ лӢӨлӢҲлҠ” м• лІҢл Ҳмқҳ мӮ¶мқ„ лІ„лҰ¬кі 집мқ„ л– лӮ¬лӢӨ. мһҗмң лЎңмҡҙ мҳҒнҳјмқҙ лҗҳмһҗ л„Ҳл¬ҙлӮҳ л§ҺмқҖ кІғл“Өмқҙ ліҙмҳҖлӢӨ.
мҳӨлһң л°©нҷ© нӣ„м—җ мқёл¬ён•ҷ к°•мқҳлҘј н•ҳкі кёҖмқ„ м“°кІҢ лҗҳл©°, к°ҖлӮңн•ҳм…ЁлҚҳ л¶ҖлӘЁлӢҳмқҙ лӮЁкІЁмЈјмӢ л„Ҳл¬ҙлӮҳ мң„лҢҖн•ң мң мӮ°мқ„ мғқк°Ғн•ҳкІҢ лҗҳм—ҲлӢӨ. л¶Җмң н•ҳкІҢ мӮҙм•„мҳЁ мӮ¬лһҢл“ӨмқҖ н’Қмҡ”лЎңмҡҙ мңЎмІҙл§ҢнҒј мҳҒнҳјмқҙ л№Ҳм•Ҫн•ҙ진лӢӨ. к·ёлҹ° мӮ¬лһҢл“Өмқҳ мқёл¬ён•ҷ к°•мқҳмҷҖ кёҖмқҖ мғҒнҲ¬м ҒмқҙлӢӨ.
лҲ„кө¬лӮҳ мЎ°кёҲл§Ң кіөл¶Җн•ҳл©ҙ н• мҲҳ мһҲлҠ” кІғл“ӨмқҙлӢӨ. мӢ мӮ°н•ң мӮ¶м—җм„ң мҶҹм•„лӮҳлҠ” л№ӣкіј н–Ҙмқҙ м—ҶлӢӨ. мқёмғқмқҳ л°‘л°”лӢҘмқ„ л№Ўл№Ў кё°м–ҙ лӢӨлӢҲл©° мӮҙм•„мҳЁ мӮ¬лһҢмқҖ мҳҒнҳјмқҳ лҲҲмқҙ лңЁмқҙкІҢ лҗңлӢӨ. м„ёмғҒмқҳ мқҙм№ҳк°Җ нӣӨнһҲ ліҙмқёлӢӨ.
м—ӯмӮ¬мқҳ нҡҚмқ„ к·ёмқҖ мӮ¬лһҢл“ӨмқҖ лӢӨ л№ҲмІңн•ң м¶ңмӢ л“ӨмқҙлӢӨ. л¶Ҳл©ёмқҳ нҷ”к°Җ л№Ҳм„јнҠё л°ҳ кі нқҗлҠ” л§җн–ҲлӢӨ.
вҖңлҠҷкі к°ҖлӮңн•ң мӮ¬лһҢл“Өмқҙ м–јл§ҲлӮҳ м•„лҰ„лӢӨмҡҙм§Җ, к·ёл“Өмқ„ л¬ҳмӮ¬н•ҳкё°м—җ м Ғн•©н•ң л§җмқ„ м°ҫмқ„ мҲҳк°Җ м—ҶлӢӨ.вҖқ
к·ёк°Җ к·№н•ңмқҳ к°ҖлӮңмқ„ кІҪн—ҳн–Ҳкё°м—җ, к·ёлҹ° мң„лҢҖн•ң лҲҲмқ„ к°Җм§Ҳ мҲҳ мһҲкІҢ лҗҳм—Ҳмқ„ кІғмқҙлӢӨ. л§ҺмқҖ мӮ¬лһҢл“Өмқҙ мқҳл¬ёмқ„ к°Җм§Ҳ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вҖҳлҒқлӮҙ мһҗмӮҙн•ң к·ёк°Җ н–үліөн–ҲкІ лҠҗлғҗ?вҖҷкі .
кіөмһҗлҠ” мқјм°Қмқҙ л§җн–ҲлӢӨ.
вҖңм•„м№Ём—җ лҸ„лҘј л“Өмңјл©ҙ м Җл…Ғм—җ мЈҪм–ҙлҸ„ мўӢлӢӨ.вҖқ
мқёмғқмқҖ кёёмқҙк°Җ м•„лӢҲлӢӨ. м•„л¬ҙлҰ¬ кёҙ м„ёмӣ”лҸ„ м§ҖлӮҳкі ліҙл©ҙ, н•ңмҲңк°„мқҙлӢӨ. кіөлЈЎмӢңлҢҖлҘј мғқк°Ғн•ҙліҙмһҗ. н•ңмҲңк°„мңјлЎң лҠҗк»ҙм§Җм§Җ м•ҠлҠ”к°Җ? лӘЁл“ мӢңк°„мқҖ н•ңмҲңк°„мқҙлӢӨ. мӨ‘мҡ”н•ң кұҙ, н•ҳлҠҳлЎң мҶҹкө¬міҗ мҳӨлҘҙлҠ” мӢңк°„, нҸӯл°ңн•ҳлҠ” мӢңк°„, кҪғмңјлЎң н”јм–ҙлӮҳлҠ” мӢңк°„мқҙлӢӨ.
кіјкұ°лҘј лҗҳлҸҢм•„ліҙл©ҙ, к·ёлҹ° мӢңк°„л“Өмқҙ мһҲлӢӨ. мҳҒмӣҗмңјлЎң мІҙн—ҳлҗҳлҚҳ мӢңк°„л“Ө. м°°лӮҳк°Җ мҳҒмӣҗмқҙм—ҲлӢӨ. кі нқҗмқҳ к·ёлҰјл“Өмқ„ ліҙмһҗ. л¶Ҳл©ёмқҙ м•„лӢҢк°Җ? л¶Ҳл©ёмқҳ мӢңк°„ мҶҚмңјлЎң мҡ°лҰ¬лҘј мқҙлҒҢм–ҙк°Җм§Җ м•ҠлҠ”к°Җ?
к·ёлһҳм„ң кіөмһҗлҠ” мқҙлҹ° мӢңк°„мқҙлқјл©ҙ н•ҳлЈЁлҘј мӮҙм•„лҸ„ мўӢлӢӨкі л§җн•ң кІғмқҙлӢӨ. мҳҒнҳјк№Ңм§Җ нҢ”м•„ м ҠмқҢмқҳ мҫҢлқҪмқ„ лҲ„лҰ¬лҚҳ нҢҢмҡ°мҠӨнҠёлҠ” м–ҙлҠҗ мҲңк°„, мҷём№ңлӢӨ.
вҖңл©Ҳм¶°лқј! мӢңк°„мқҙм—¬! л„Ҳ м•„лҰ„лӢөкө¬лӮҳ!вҖқ
м•„лҰ„лӢӨмӣҖмқ„ мҳЁлӘёмңјлЎң лҠҗлҒјлҠ” мҲңк°„, мҡ°лҰ¬лҠ” мЈҪм–ҙлҸ„ мўӢлӢӨ! мқҙлҹ° мҲңк°„мқ„ м•ҢкІҢ лҗҳл©ҙ, мҡ°лҰ¬лҠ” лҚ” мқҙмғҒ л•…мқҳ ліөм—җ м—°м—°н•ҳм§Җ м•ҠкІҢ лҗ кІғмқҙлӢӨ.
[кі м„қк·ј]
мҲҳн•„к°Җ
мқёл¬ён•ҷ к°•мӮ¬
н•ңкөӯмӮ°л¬ё мӢ мқёмғҒ
м ң6нҡҢ лҜјл“Өл Ҳл¬ён•ҷмғҒ мҲҳмғҒ.
мқҙл©”мқј: ksk21ccc-@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