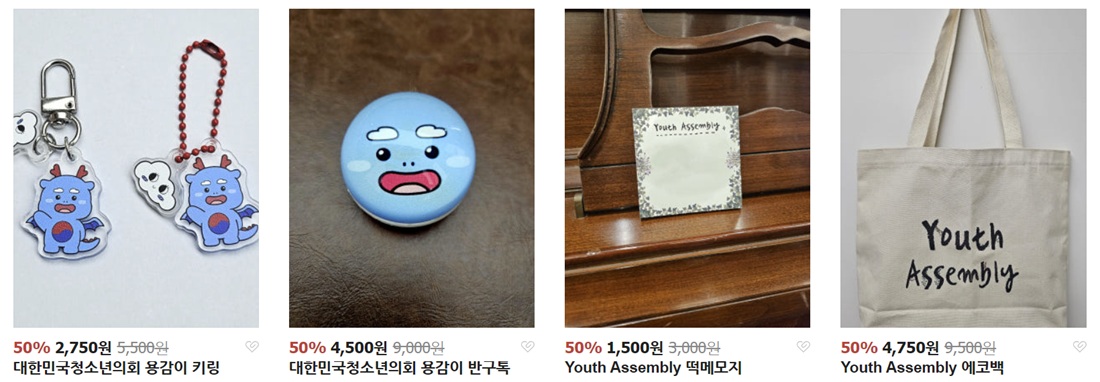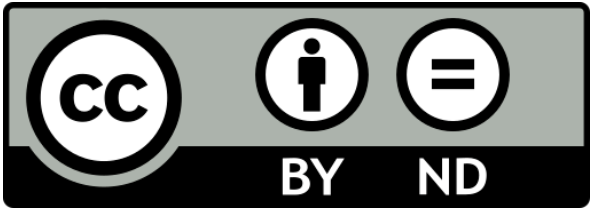1991л…„, мҶҢ비м—җнҠё мӮ¬нҡҢмЈјмқҳ кіөнҷ”көӯ м—°л°©(мқҙн•ҳ мҶҢл Ё)мқҳ н•ҙмІҙм—җ н•©мқҳн•ң нӣ„ м—°л°© мҶҢмҶҚмқҙлҚҳкіөнҷ”көӯ лҢҖлӢӨмҲҳк°Җ лҸ…лҰҪкөӯк°Җм—°н•©(CIS)мқ„ кІ°м„ұн•ҳм—¬ мҶҢл Ёмқҙ л¶Җмһ¬н•ҳлҠ” мһҗлҰ¬лҘј лҢҖмІҙн•ҳкі мһҗ н–ҲлӢӨ. л¬јлЎ м•„лӢҢ көӯк°ҖлҸ„ мһҲм§Җл§Ң м—¬лҹ¬ көӯк°Җк°Җ лҹ¬мӢңм•„лЎңл¶Җн„°мқҳ лҸ…лҰҪмқ„ к·ёл ёлӢӨ. к·ёлҹ¬лӮҳ көӯм ң мӮ¬нҡҢлҠ” мқҙлҘёл°” вҖҳкө¬мҶҢл Ё көӯк°ҖвҖҷлқјкі л¶ҲлҰ¬мҡ°лҠ” мқҙ лҸ…лҰҪкөӯк°Җм—°н•© көӯк°Җл“Өмқҳ мҲҳм—ҶлҠ” нҳјлһҖмқ„ м§Җмјңліҙм•ҳлӢӨ. лӘ°лҸ„л°”-нҠёлһҖмҠӨлӢҲмҠӨнҠёлҰ¬м•„ м „мҹҒ, м•„лҘҙл©”лӢҲм•„-м•„м ңлҘҙл°”мқҙмһ” м „мҹҒ, мІҙмІё мӮ¬нғң, лӮЁмҳӨм„ёнӢ°м•ј м „мҹҒ, мң лЎңл§ҲмқҙлӢЁ, нҒ¬лҰј л°ҳлҸ„мқҳ лҸ…лҰҪкіј лҹ¬мӢңм•„мқҳ нҒ¬лҰј л°ҳлҸ„ н•©лі‘, лҸҲл°”мҠӨ м „мҹҒ л“ұ мҰҗ비н•ҳлӢӨ. м •лҸҲ лҗҳм§Җ м•ҠмқҖ мұ„ кі„мҶҚ нҸӯл Ҙкіј мғҒмІҳл§Ңмқ„ м•јкё°н•ҳлҠ” мқҙ көӯк°Җл“Өмқҳ н–үліҙлҠ” м–ҙм ң мҳӨлҠҳ мқјмқҙ м•„лӢҲлӢӨ.
к·ёлҹ¬лӢҲ м–ёлЎ мһҗмң м§ҖмҲҳлҠ” м–ҙл ЁнһҲ м•Ңл§Ңн•ҳлӢӨ. көӯкІҪ м—ҶлҠ” кё°мһҗнҡҢ(Reporters Without Borders)к°Җ 2020л…„ лӮҙлҶ“мқҖ м–ёлЎ мһҗмң м§ҖмҲҳ мҲңмң„м—җ л”°лҘҙл©ҙ к·ёлӮҳл§Ҳ лҶ’мқҖ 축м—җ мҶҚн•ҳлҠ” нӮӨлҘҙкё°мҠӨмҠӨнғ„мқҙ 180к°ңкөӯ мӨ‘ 82мң„мқҙлӢӨ. мӨ‘м•ҷм•„мӢңм•„мқҳ нҲ¬лҘҙнҒ¬л©”лӢҲмҠӨнғ„мқҖ, кјҙм°Ңмқё л¶Ғн•ңмқҳ л°”лЎң мң— лӢЁкі„, 179мң„мқҙлӢӨ. мӮ¬мӢӨмғҒ кјҙм°ҢлӢӨ.
мқҙл ҮкІҢ кІҪм§Ғлҗң мІҙм ң мҶҚм—җм„ң кө¬мҶҢл Ёмқҳ м—¬лҹ¬ көӯк°Җл“Өмқҙ, л§ҺмқҖ м–ёлЎ мқёл“Өмқ„ м§ҖмҶҚм ҒмңјлЎң нғ„м••н•ҳкі мһҲлӢӨ. лҜёкөӯл¬ҙл¶Җмқҳ лҜјмЈјмЈјмқҳмҷҖ мқёк¶Ң л°Ҹ л…ёлҸҷл¬ём ң лӢҙлӢ№, вҖҳлЎңл„Ө нҒ¬л Ҳмқҙл„ҲвҖҷ м°ЁкҙҖліҙм—җ л”°лҘҙл©ҙ, мқҙлҹ° нғ„м••мқҳ нҳ•нғңлҠ” мӢ мІҙм Ғ н•ҷлҢҖм—җм„ң лІ•м Ғ, кҙҖлЈҢм Ғ нҳ‘л°•м—җ мқҙлҘҙкё° к№Ңм§Җ лӢӨм–‘н•ҳлӢӨ(voakorea.com, 2020.11.11).
лІЁлқјлЈЁмҠӨмқҳ м–ёлЎ мқё л“ңлҜёнҠёлҰ¬ мһҗл°”л“ңмҠӨнӮӨ мӢӨмў… мӮ¬кұҙ, мҡ°нҒ¬лқјмқҙлӮҳмқҳ м–ёлЎ мқё лё”лқјл“ңлҜёлҘҙ мҳҲн”„л ҲлӘЁлёҢ мқҳл¬ё мӮ¬л§қ мӮ¬кұҙкіј м–ёлЎ мқё м•„мқҙнҳё м•Ңл үмӮ°л“ңлЎңлёҢ мӮҙн•ҙ мӮ¬кұҙ, м№ҙмһҗнқҗмҠӨнғ„мқҳ м–ёлЎ мқё м„ёлҘҙкІҢмқҙ л‘җл°”л…ёлёҢ нҲ¬мҳҘ мӮ¬кұҙ, мҡ°мҰҲлІ нӮӨмҠӨнғ„мқҳ м–ёлЎ мқё лҹ¬мҠ¬лһҖ мҠӨлҰ¬нҸ¬лёҢ мң мЈ„нҢҗкІ°. к·ёлҰ¬кі л¶Ғн•ң лӢӨмқҢмңјлЎң м–ёлЎ мһҗмң м§ҖмҲҳ кјҙм°ҢлҘј лӢ¬лҰ¬лҠ” нӮӨлҘҙкё°мҠӨмҠӨнғ„мқҳ мӢ л¬ё 'лӘЁм•ј мҠӨнҶЁлҰ¬мұ 'м§Җ мҶҢмҶЎ л°Ҹ нҢҢмӮ° мӮ¬кұҙ л“ұ лӮҳм—ҙн•ҳмһҗл©ҙ к·јлһҳ м–ёлЎ мқё нғ„м•• мӮ¬лЎҖк°Җ көӯк°Җлі„лЎң лӮҳм—ҙмқҙ к°ҖлҠҘн•ҳлӢӨ.
кө¬мҶҢл Ёмқҳ лҢҖн‘ңкөӯ лҹ¬мӢңм•„лҸ„ мӮ¬м •мқҖ л§Ҳм°¬к°Җм§ҖмқҙлӢӨ. мөңк·ј TVS л°©мҶЎ нҸҗм—…мңјлЎң, лҹ¬мӢңм•„м—җ лӮЁм•„мһҲлҚҳ мң мқјн•ң м •л¶Җ к°ңмһ… м—ҶлҠ” лҸ…мһҗм Ғ л°©мҶЎкөӯ л§Ҳм Җ мӮ¬лқјм§ҖкІҢ лҗҳм—ҲлӢӨ.
2020л…„ кё°мӨҖ м–ёлЎ мһҗмң м§ҖмҲҳлҠ” к°Ғк°Җ лҹ¬мӢңм•„ 149мң„, мҡ°нҒ¬лқјмқҙлӮҳ 96мң„, нҲ¬лҘҙнҒ¬л©”лӢҲмҠӨнғ„ 179мң„, м•„м ңлҘҙл°”мқҙмһ” 168мң„, нӮӨлҘҙкё°мҠӨмҠӨнғ„ 82мң„лҘј кё°лЎқн–Ҳ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