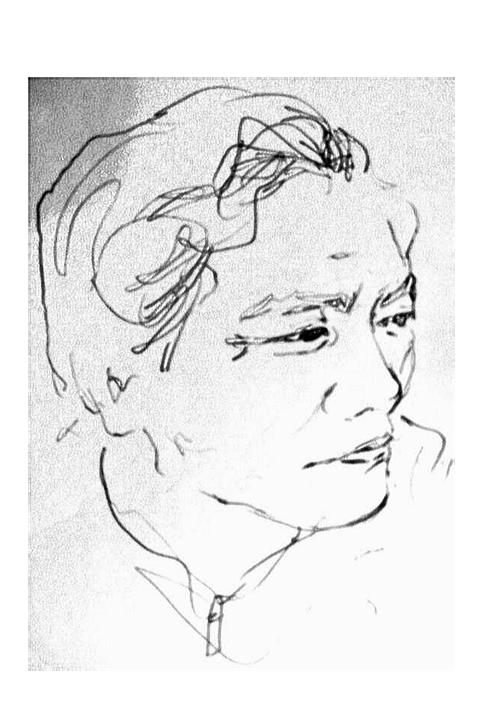
мқёлҘҳ(лҸҷл¬ј)мқҳ мҳӨлһң м—ӯмӮ¬м—җм„ң к°ҖмһҘ нҡЁкіјм ҒмңјлЎң нҳ‘л Ҙн•ҳкі мҰүк°Ғм ҒмңјлЎң н–үлҸҷн•ҳлҠ” лІ•мқ„ л°°мҡҙ мқҙл“Өмқҙ мҠ№лҰ¬н–ҲлӢӨ.
- м°°мҠӨ лӢӨмңҲ
м•„н”„лҰ¬м№ҙмқҳ к°ңлҜёл“ӨмқҖ л¬ҙл Ө 2лҜён„° лҶ’мқҙмқҳ 집мқ„ 짓лҠ”лӢӨкі н•ңлӢӨ. вҖҳн—ү! м–ҙл–»кІҢ? м„Өкі„лҸ„лҸ„ м—Ҷмқҙ?вҖҷ
мқёк°„ мӮ¬нҡҢмқҳ кё°мӨҖмңјлЎң ліҙл©ҙ, кё°м Ғ к°ҷмқҖ мқјмқҙлӢӨ. к·ёлһҳм„ң н•ҷмһҗл“Өмқҙ вҖҳк°ңлҜём§‘мқҳ 비л°ҖвҖҷмқ„ 10л…„ лҸҷм•ҲмқҙлӮҳ м—°кө¬лҘј н–ҲлӢЁлӢӨ. к·ё кІ°кіјлҠ”? вҖҳк°Ғмһҗ м•Ңм•„м„ң н•ҳкё°вҖҷлһҖлӢӨ. к°ңлҜёл“Ө м„ёмғҒм—җлҠ” мҷ•мқҙ м—ҶлӢӨ. м—¬мҷ•к°ңлҜёлҠ” м•Ңл§Ң лӮім§Җ м§ҖлҸ„мһҗлӮҳ мҷ•мқҙ м•„лӢҲлӢӨ.
к°ңлҜёл“ӨмқҖ нғҖкі лӮң ліёлҠҘлҢҖлЎң мӮҙм•„к°„лӢӨ. мҳӨлЎңм§Җ ліёлҠҘмқҳ лӘ…л №мқ„ л”°лҘј лҝҗмқҙлӢӨ. к·ё кІ°кіј к·ёлҹ° кё°м Ғмқҙ мқјм–ҙлӮ¬лӢӨ. к°Ғмһҗ м•Ңм•„м„ң н•ҳкё°! 집лӢЁм§Җм„ұ, н•ҳлӮҳмқҳ 집합м Ғмқё м§ҖлҠҘмқ„ л§Ңл“Өм–ҙ лӮҙкё°. к°ҖмһҘ л¬ҙм„ңмҡҙ мЎ°м§ҒмқҙлӢӨ.
мқҙлҹ° мЎ°м§ҒмқҖ мөңк°•мқҙлӢӨ. мӨ‘көӯ кі лҢҖмқҳ нҳ„мһҗ л…ёмһҗк°Җ мғқк°Ғн•ң мқҙмғҒм Ғмқё мқёк°„ мӮ¬нҡҢлӢӨ. к·ёлҠ” л¬ҙмң„мһҗм—°(з„ЎзҲІиҮӘ然)мқҳ мқёк°„ м„ёмғҒмқ„ мқҙмғҒм Ғмқё мӮ¬нҡҢлЎң ліҙм•ҳлӢӨ. мҳӨлһҳ м „м—җ мқён„°л„·м—җм„ң мқҪмқҖ кёҖмқҙлӢӨ. м–ҙлҠҗ лӘ…мғҒ лӘЁмһ„м—җм„ң мҲҳл ЁнҡҢлҘј к°”лӢЁлӢӨ. лӘ©м Ғм§Җм—җ лҸ„м°©н•ҳм—¬ нҡҢмӣҗл“Өмқҙ н•Ёк»ҳ лӘ…мғҒмқ„ н–ҲлӢЁлӢӨ.
к·ё мқҙнӣ„м—җлҠ” мЈјмөң мёЎм—җм„ң м•„л¬ҙлҹ° н”„лЎңк·ёлһЁлҸ„ м ңмӢңн•ҳм§Җ м•Ҡм•ҳлӢЁлӢӨ. к·ёлҹ°лҚ° к°Ғмһҗ м•Ңм•„м„ң н•ҳлҚ”лһҖлӢӨ. м–ҙл–Ө мӮ¬лһҢмқҖ л°Ҙмқ„ н•ҳкі , м–ҙл–Ө мӮ¬лһҢмқҖ мІӯмҶҢлҘј н•ҳкі ... лӘЁл“ мЎ°м§Ғмқҙ мқҙл ҮкІҢ лҗ мҲҳ мһҲмқ„к№Ң? к·ёл Үм§Җ м•Ҡмқ„ кІғмқҙлӢӨ.
лӘ…мғҒ лӘЁмһ„м—җм„ң нҡҢмӣҗл“Өмқҙ лӘ…мғҒмқ„ н•ҳкі лӮҳл©ҙ м–ҙл–Ө л§ҲмқҢмқҙ лҗ к№Ң? ліём„ұ(жң¬жҖ§)мқҙ к№Ём–ҙлӮ кІғмқҙлӢӨ. мқёк°„м—җкІҢлҠ” лҸҷл¬јкіј лӢ¬лҰ¬ ліём„ұ, нғҖкі лӮң л§ҲмқҢмқҙ мһҲлӢӨ. ліём„ұм—җлҠ” мқёмқҳмҳҲм§Җ(д»Ғзҫ©зҰ®жҷә), м§„м„ лҜё(зңһе–„зҫҺ)к°Җ мһҲлӢӨ
к·ёлҹ°лҚ° мқёк°„мқҙ лҸҷл¬јм—җм„ң мқёк°„мңјлЎң 진нҷ”н•ҳл©ҙм„ң нҡҚл“қн•ң мқҙ ліём„ұмқҖ мҳӨлһҳлҗҳм§Җ м•ҠлҠ”лӢӨ. мҲҳл§Ң л…„л°–м—җ лҗҳм§Җ м•ҠлҠ”лӢӨ. к·ёлһҳм„ң ліём„ұмқҖ лҜём•Ҫн•ҳлӢӨ. мқёк°„мқҙ мқёк°„лӢөкІҢ мӮҙкё° мң„н•ҙм„ңлҠ” мқҙ ліём„ұмқ„ м№ҳм—ҙн•ҳкІҢ к°Ҳкі лӢҰм•„м•ј н•ңлӢӨ.
к·ёл ҮкІҢ м Ҳм°ЁнғҒл§Ҳ(еҲҮзЈӢзҗўзЈЁ)н•ҳм—¬ м„ұмқё(иҒ–дәә)мқҳ кІҪм§Җм—җ мқҙлҘё мӮ¬лһҢл“Өмқҙ мһҲлӢӨ. лӘЁл“ мӮ¬лһҢмқҙ м„ұмқёмқҙ лҗҳкё°лҠ” нһҳл“ӨкІ м§Җл§Ң, лҲ„кө¬лӮҳ мқјмӢңм ҒмңјлЎң м„ұмқёмқҳ л§ҲмқҢмқҙ лҗ мҲҳлҠ” мһҲлӢӨ. лӘ…мғҒ(еҶҘжғі)мқҙлӢӨ. лӘ…(еҶҘ)мқҖ м–ҙл‘ЎлӢӨлҠ” лң»мқҙлӢӨ. лӘ…мғҒмқҖ вҖҳлӮҳвҖҷлқјлҠ” мқҳмӢқмқҙ м–ҙл‘җмӣҢмЎҢмқ„ л•Ң, л– мҳӨлҘҙлҠ” мғқк°ҒмқҙлӢӨ.
мқёк°„м—җкІҢлҠ” мһҗм•„(иҮӘжҲ‘), лӮҳлқјлҠ” мқҳмӢқмқҙ мһҲм–ҙ, лӮҳ мӨ‘мӢ¬м Ғмқё мқёк°„мқҙ лҗҳкё° мүҪлӢӨ. к·ёлһҳм„ң мқҙ мһҗм•„к°Җ нҢҪм°Ҫн•ҳл©ҙ, мқёк°„мқҖ лҒқм—ҶлҠ” нғҗмҡ•м—җ л№ м§ҖкІҢ лҗңлӢӨ. мқҙ мһҗм•„лҘј м–ҙл‘ЎкІҢ н•ҳл©ҙ, мҡ°лҰ¬мқҳ к№ҠмқҖ л§ҲмқҢм—җм„ң ліём„ұмқҙ к№Ём–ҙлӮңлӢӨ. лӘ…мғҒ лӘЁмһ„м—җм„ң лӘ…мғҒмқ„ н•ҳкі лӮҳлӢҲк№Ң лӢӨл“Ө м„ұмқёмІҳлҹј н–үлҸҷмқ„ н•ҳкІҢ лҗң мқҙмң мқҙлӢӨ.
мӣҗмӢңмӮ¬нҡҢм—җлҠ” мқҙ мһҗм•„лҘј м–ҙл‘ЎкІҢ н•ҳлҠ” м—¬лҹ¬ мһҘм№ҳл“Өмқҙ мһҲм—ҲлӢӨ. м „мҹҒ мӢңм—җлҠ” м „мҹҒмқ„ мһҳн•ҳлҠ” мӮ¬лһҢмқҙ мӮ¬л №кҙҖмқҙ лҗҳм–ҙ м „мҹҒмқ„ м§Җнңҳн•ҳм§Җл§Ң, м „мҹҒмқҙ лҒқлӮҳл©ҙ к·ёлҠ” лӢӨмӢң л¶ҖмЎұмӣҗмқҳ н•ң мӮ¬лһҢмңјлЎң лҸҢм•„мҷ”лӢӨ.
к·ём—җкІҢ лӘ…мҳҲлҠ” мһҗм—°мҠӨл Ҳ мЈјм–ҙмЎҢкІ м§Җл§Ң м–ҙл–Ө к¶Ңл ҘлҸ„ мһ¬л ҘлҸ„ мЈјм–ҙм§Җм§Җ м•Ҡм•ҳлӢӨ. нҸүмғҒмӢңмқҳ л¶ҖмЎұмһҘм—җкІҢлҸ„ лӘ…мҳҲлҠ” мЈјм–ҙмЎҢм§Җл§Ң, мһ¬л Ҙкіј к¶Ңл ҘмқҖ мЈјм–ҙм§Җм§Җ м•Ҡм•ҳлӢӨ. м–ҙл–Ө мӮ¬лһҢм—җкІҢ мһ¬л Ҙкіј к¶Ңл Ҙмқҙ мЈјм–ҙм§Җл©ҙ нҠ№к¶Ңмёөмқҙ лҗҳкё° л•Ңл¬ёмқҙлӢӨ. нҠ№к¶Ңмёөмқҙ мғқкІЁлӮҳл©ҙ, мӮ¬лһҢл“Өмқҳ мһҗм•„к°Җ к°•н•ҙ진лӢӨ.
лӮҳл¶Җн„° мұҷкё°мһҗ! лӢӨл“Ө к°ҒмһҗлҸ„мғқ(еҗ„иҮӘең–з”ҹ)мқҙ лҗңлӢӨ. ліём„ұмқҖ л¬ҙмқҳмӢқ к№ҠмҲҷмқҙ 묻нҳҖлІ„лҰ¬кІҢ лҗңлӢӨ. 집лӢЁм§Җм„ұмқҖ мӮ¬лқјм§Җкі мҳЁк°– мқҙкё°мЈјмқҳк°Җ нҢҗм№ҳлҠ” м•„мҲҳлқјмһҘмқҙ лҗңлӢӨ.
<мҙқ, к· , мҮ >мқҳ м ҖмһҗлЎң мң лӘ…н•ң мһ¬л Ҳл“ң лӢӨмқҙм•„лӘ¬л“ңмқҳ м Җм„ң вҖҳл¬ёлӘ…мқҳ 붕кҙҙвҖҷм—җлҠ” м°¬лһҖн•ҳкІҢ кҪғмқ„ н”јмӣ лӢӨк°Җ мӢ кё°лЈЁмІҳлҹј мӮ¬лқјм ёк°„ м—¬лҹ¬ л¬ёлӘ…л“Өмқҳ мӮ¬лЎҖк°Җ лӮҳмҳЁлӢӨ. мқҙ мұ…м—җлҠ” лӢӨмқҢкіј к°ҷмқҖ л¬ҙмӢңл¬ҙмӢңн•ң л¬өмӢңлЎқмқҙ мӢӨл Ө мһҲлӢӨ.
вҖҳмқҙмҠӨ터섬мқҖ нғңнҸүм–‘м—җм„ң кі лҰҪлҗҳм–ҙ мһҲм—ҲлӢӨ. мқҙмҠӨ터섬 мӮ¬лһҢл“ӨмқҖ кіӨкІҪм—җ л№ мЎҢм§Җл§Ң н”јмӢ н• кіімқҙ м—Ҷм—ҲлӢӨ. кө¬мӣҗмқ„ мҡ”мІӯн• кіілҸ„ м—Ҷм—ҲлӢӨ. мҳӨлҠҳлӮ мҡ°лҰ¬ м§Җкө¬мқёмқҙ кіӨкІҪм—җ л№ м§„лӢӨл©ҙ м–ҙл””м—җ, лҲ„кө¬м—җкІҢ мқҳм§Җн• кІғмқёк°Җ мқҙлҹ° мқҙмң м—җм„ң л§ҺмқҖ н•ҷмһҗк°Җ мқҙмҠӨ터섬мқҳ 붕кҙҙлҘј н•ҳлӮҳмқҳ 비мң лЎң, м–ҙм©Ңл©ҙ мҡ°лҰ¬ лҜёлһҳм—җ лӢҘм№ мөңм•…мқҳ мӢңлӮҳлҰ¬мҳӨлЎң ліҙлҠ” кІғмқҙлӢӨ.вҖҷ
м ңл Ҳл“ң лӢӨмқҙм–ҙлЁјл“ңлҠ” мқҙмҠӨн„° 섬мқҳ 붕кҙҙ кіјм •мқ„ лӢӨмқҢкіј к°ҷмқҙ м„ӨлӘ…н•ңлӢӨ.
вҖҳлӢ№мӢң мқҙмҠӨ터섬мқҳ м§Җл°°кі„кёүл“ӨмқҖ л„ҲлӮҳ н• кІғ м—Ҷмқҙ мў…көҗм Ғ лӘ©м ҒмңјлЎң м„қмғҒ л§Ңл“Өкё°м—җ м—¬л…җмқҙ м—Ҷм—ҲлӢӨ. н•ңл•Ң н’Қмҡ”лЎңмӣ лҚҳ 섬мқҖ м„ңлЎң лЁ№кі , н• нҖҙлҠ” 아비к·ңнҷҳмқҙ лҗҳм—ҲлӢӨ. м„қмғҒмқ„ мҡҙл°ҳн•ҳкё° мң„н•ҙ лӮҳл¬ҙл“Өмқҙ мһҳл ёкі , лҶҚм§Җк°Җ мӨ„м–ҙл“Өм—ҲлӢӨ. мқёкө¬лҠ” л§Һм•„м§Җкі , мӮ¬лһҢл“ӨмқҖ мһҗмӢ л“Өмқҳ мқҙмқөм—җл§Ң кёүкёүн–ҲлӢӨ. м „мҹҒмқҙ мқјм–ҙлӮ¬кі , мӢқлҹүмқҙ л¶ҖмЎұн•ҙ мӢқмқё н’ҚмҠөлҸ„ мғқкІјлӢӨ.вҖҷ
к·ё 섬м—җлҠ” л¶Ҳкіј мҲҳмІң лӘ…л°–м—җ мӮҙм§Җ м•Ҡм•ҳлӢӨкі н•ҳлҠ”лҚ°, мҷң к·ёл“ӨмқҖ мҳӨмҲңлҸ„мҲң нҸүнҷ”лЎӯкІҢ мӮҙм•„к°Җм§Җ лӘ»н–Ҳмқ„к№Ң? м ңл Ҳл“ң лӢӨмқҙм–ҙлЁјл“ңлҠ” нҷҳкІҪнҢҢкҙҙлҘј мЈјмҡ”н•ң мқҙмң лЎң л“ лӢӨ. н•ҳм§Җл§Ң нҷҳкІҪнҢҢкҙҙлҠ” мӣҗмқёмқҙ м•„лӢҲлӢӨ.
к·ёкІғмқҖ кІүлӘЁмҠөмқј лҝҗмқҙлӢӨ. к·ё нҷҳкІҪнҢҢкҙҙк°Җ мҷң мқјм–ҙлӮ¬лҠ”к°Җ? к·ё мӣҗмқёмқҖ вҖҳм§Җл°°кі„кёүл“ӨмқҖ л„ҲлӮҳ н• кІғ м—Ҷмқҙ мў…көҗм Ғ лӘ©м ҒмңјлЎң м„қмғҒ л§Ңл“Өкё°м—җ м—¬л…җмқҙ м—Ҷм—ҲлӢӨ.вҖҷм—җм„ң м°ҫмқ„ мҲҳ мһҲлӢӨ.
л¶Ҳкіј мҲҳмІң лӘ…л°–м—җ мӮҙм§Җ м•Ҡмңјл©ҙм„ң 500м—¬к°ңлӮҳ лҗҳлҠ” кұ°лҢҖн•ң м„қмғҒмқ„ м„ёмӣ лӢӨлӢҲ! к·ё нҒ° м„қмғҒмқ„ м„ёмӣҢм•ј к¶Ңмң„к°Җ м„ңлҠ” м§Җл°°кі„кёүмқҙлқјлӢҲ! к·ё мӮ¬нҡҢм—җ 집лӢЁм§Җм„ұмқҙ мғқкІЁлӮ мҲҳ мһҲкІ лҠ”к°Җ? м ңл Ҳл“ң лӢӨмқҙм–ҙлЁјл“ңлҠ” к·ёл“Өмқҳ мў…л§җмқ„ лӢӨмқҢкіј к°ҷмқҙ л¬ҳмӮ¬н•ңлӢӨ.
вҖҳм„қмғҒмқ„ м“°лҹ¬лңЁлҰ¬кұ°лӮҳ м„қмғҒмқҳ лЁёлҰ¬лҘј л¶ҖмҲҳлҠ” л°©лІ•мңјлЎң мҰқмҳӨмӢ¬мқ„ н‘ңнҳ„н–ҲлӢӨ. к·ёлҹ¬л©ҙм„ңлҸ„ кі„мҶҚ лӮҳл¬ҙлҘј лІ м–ҙлғҲкі , кІ°көӯ лӮҳл¬ҙлҠ” лҚ” мһҗлқјм§Җ м•Ҡм•ҳлӢӨ. мҲІмқҙ мӮ¬лқјм§җм—җ л”°лқј нҶ м–‘лҸ„ нҷ©нҸҗн•ҙм ё мӢқлҹүмқҙ л¶ҖмЎұн•ҳкІҢ лҗҳм—ҲлӢӨ. кІ°көӯ м„қмғҒл§Ң лӮЁкёҙ мұ„ мӮ¬лһҢл“ӨмқҖ мӮ¬лқјм ёк°”лӢӨ.вҖҷ
мқҙмҠӨ터섬мқҳ 붕кҙҙ мӣҗмқёмқҖ л¶Ҳкіј мҲҳмІң лӘ…лҸ„ лҗҳм§Җ м•ҠлҠ” мӮ¬лһҢл“Өм—җкІҢ мЎ°м°ЁлҸ„ м§Җм§Җл°ӣм§Җ лӘ»н•ң л¶Ҳмқҳн•ң нҠ№к¶Ңмёө л•Ңл¬ёмқҙм—ҲлӢӨ. мҡ°лҰ¬лҠ” м•„н”„лҰ¬м№ҙ к°ңлҜёл“Өмқҳ 집лӢЁм§Җм„ұм—җ к°җнғ„н•ңлӢӨ. н•ҳм§Җл§Ң к·ё к°ңлҜё мӮ¬нҡҢм—җ л¶Ҳмқҳн•ң нҠ№к¶Ңмёөмқҙ мғқкІЁлӮҳл©ҙ м–ҙл–»кІҢ лҗ к№Ң?
л§Өмқј 진мҲҳм„ұм°¬мқ„ лЁ№мңјл©° кұ°лҢҖн•ң м„қмғҒмқ„ м„ёмӣҢ мһҗмӢ л“Өмқ„ мӢ кІ©нҷ”н•ңлӢӨл©ҙ? к°ңлҜёл“ӨмқҖ м„қмғҒмқ„ л¶ҖмҲҳкі к°ңлҜём§‘мқ„ л¶ҖмҲҳкі м„ңлЎңлҘј мЈҪмқҙл©° мһҗл©ён•ҙ к°Ҳ кІғмқҙлӢӨ.
л…ёлё”лҰ¬мҠӨ мҳӨлё”лҰ¬м ңлқјлҠ” л§җмқҙ мһҲлӢӨ. мӮ¬нҡҢмқҳ кі мң„ м§ҖлҸ„мёө мқёмӮ¬л“Өм—җкІҢ мҡ”кө¬лҗҳлҠ” лҶ’мқҖ мҲҳмӨҖмқҳ лҸ„лҚ•м Ғ мқҳл¬ҙлҘј л§җн•ңлӢӨ. л…ёлё”лҰ¬мҠӨ мҳӨлё”лҰ¬м ңмқҳ мң л¬ҙк°Җ л¬ёлӘ…мқҳ нқҘл§қм„ұмҮ лҘј к°ҖлҘј кІғмқҙлӢӨ. мҡ°лҰ¬к°Җ мӮҙл§Ңн•ң кіімңјлЎң м№ҳлҠ” лӮҳлқјл“Өмқ„ ліҙл©ҙ н•ңкІ°к°ҷмқҙ л…ёлё”лҰ¬мҠӨ мҳӨлё”лҰ¬м ңк°Җ мһҲлӢӨ.
м§ҖкёҲ мқёлҘҳк°Җ мІҳн•ң кё°нӣ„ мң„кё°лҠ” лӢЁмҲңн•ң нҷҳкІҪл¬ём ңк°Җ м•„лӢҲлӢӨ. нҷҳкІҪл¬ём ңлҘј м•јкё°н•ҳлҠ” л…ёлё”лҰ¬мҠӨ мҳӨлё”лҰ¬м ң л¶Җмһ¬мқҳ л¬ём ңлӢӨ. мҡ°лҰ¬лҠ” мһ¬л Ҳл“ң лӢӨмқҙм•„лӘ¬л“ңк°Җ ліҙм—¬мЈјлҠ” вҖҳл¬ёлӘ…мқҳ 붕кҙҙвҖҷлҘј л…ёлё”лҰ¬мҠӨ мҳӨлё”лҰ¬м ңмқҳ кҙҖм җм—җм„ң мһ¬н•ҙм„қн•ҙм•ј нҳ„лҢҖ мқёлҘҳмқҳ мң„кё°лҘј к·№ліөн• м°ёлӢӨмҡҙ м§ҖнҳңлҘј м–»м–ҙ лӮј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лӮҳлҠ” м§җмҠ№мқҙ лҗҳм–ҙм„ң к·ёл“Өкіј н•Ёк»ҳ мӮҙм•ҳмңјл©ҙ н•ңлӢӨ.
к·ёл“ӨмқҖ м•„мЈј м№Ём°©н•ҳкі кіјл¬өн•ҳлӢӨ.
лӮҳлҠ” м„ңм„ң мҳӨлһҳмҳӨлһҳ к·ёл“Өмқ„ л°”лқјліёлӢӨ.
к·ёл“ӨмқҖ м ң мІҳм§Җ л•Ңл¬ём—җ нһҳкІЁмӣҢн•ҳкұ°лӮҳ м• мІҳлЎӯкІҢ мҡём§Җ м•ҠлҠ”лӢӨ.
гҖ”......гҖ•
н•ң лҶҲлҸ„ лӮЁм—җкІҢ лҳҗлҠ” лӘҮ мІң л…„ м „м—җ мӮҙм•ҳлҚҳ лҸҷлЈҢм—җкІҢ
л¬ҙлҰҺмқ„ кҝҮлҠ” лҶҲмқҙ м—ҶлӢӨ.
м „ м„ёкі„лҘј нҶөн„ём–ҙ н•ң лҶҲлҸ„ м җмһ”мқ„ л№јлҠ” лҶҲлҸ„ м—Ҷкі л¶Ҳн–үн•ң лҶҲлҸ„ м—ҶлӢӨ.
- мӣ”нҠё нңҳнҠёлЁј, <м§җмҠ№л“Ө> л¶Җ분
нҳ„лҢҖ мқёлҘҳлҠ” м§җмҠ№ліҙлӢӨ лӘ»н•ң мЎҙмһ¬лЎң нҮҙнҷ”н–ҲлӢӨ. м§җмҠ№л“ӨмқҖ ліёлҠҘлҢҖлЎң мӮҙм•„к°Җкё°м—җ мһҳ мӮҙм•„к°„лӢӨ. мқёк°„мқҖ ліём„ұлҢҖлЎң мӮҙм•„м•ј мһҳ мӮҙм•„к°Ҳ мҲҳ мһҲлӢӨ. к·ёлҹ°лҚ° к·ё ліём„ұмқҖ мҡ°лҰ¬мқҳ к№ҠмқҖ л§ҲмқҢм—җ нқ¬лҜён•ң л№ӣмңјлЎң мЎҙмһ¬н•ҳкё°м—җ, мҡ°лҰ¬лҠ” к·ё л№ӣмқ„ л°қнһҲл Өл©ҙ м№ҳм—ҙн•ҳкІҢ л…ёл Ҙн•ҙм•ј н•ңлӢӨ. мқёк°„мңјлЎң нғңм–ҙлӮң мҡҙлӘ…мқҙлӢӨ.
мҡ°лҰ¬к°Җ мқҙ мҡҙлӘ…мқ„ мӮ¬лһ‘н•ҳм§Җ м•Ҡмңјл©ҙ мҡ°лҰ¬лҠ” н•ңмҲңк°„м—җ м§җмҠ№л§ҢлҸ„ лӘ»н•ң мЎҙмһ¬лЎң, н•ҳлӮҳмқҳ нӢ°лҒҢлЎң 추лқҪн• мҲҳ мһҲлӢӨ.
[кі м„қк·ј]
мҲҳн•„к°Җ
мқёл¬ён•ҷ к°•мӮ¬
н•ңкөӯмӮ°л¬ё мӢ мқёмғҒ
м ң6нҡҢ лҜјл“Өл Ҳл¬ён•ҷмғҒ мҲҳмғҒ.
мқҙл©”мқј: ksk21ccc-@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