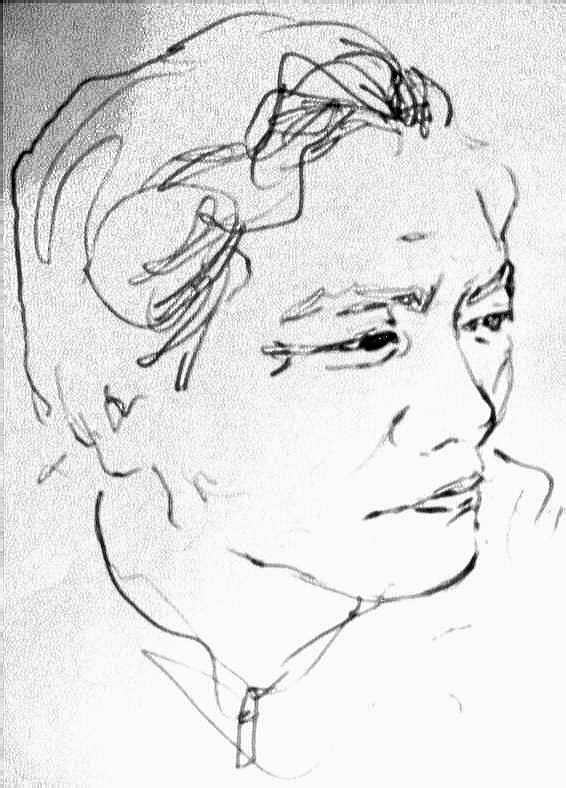
우리가 실재하는 사물과 공상의 사물에 대여했던 모든 아름다움 고상함을 나는 인간의 소유와 산물로서, 즉 인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변명으로서 반환을 요구한다.
- 프리드리히 니체, <힘에의 의지>
그저께 공부 모임에서 한 회원이 ㅇ교수를 만난 얘기를 했다.
“저의 흰 손이 부끄러웠어요. 그분의 손은 오랜 노동의 흔적이 짙게 밴 거친 손이었어요.”
우리는 유명인 앞에 서게 되면 쫄게 된다. ‘그는 강자,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농민, 노동자의 거친 손을 볼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유명인의 거친 손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추앙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는 강자이고 나는 약자일까?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착각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도 오래전에 한 유명인 앞에서 호랑이 앞의 강아지처럼 쫄았던 적이 있다. 그분이 내미는 소주잔을 나도 모르게 떨어뜨렸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진다. 나는 그 뒤 일부러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차츰 추앙하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우리가 유명인을 추앙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유명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점을 잘 봐야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추앙할만한 미덕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 미덕을 잘 키워가야 한다.
니체는 “우리가 실재하는 사물과 공상의 사물에 대여했던 모든 아름다움 고상함은 인간의 소유와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아름다움 고상함의 반환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투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압도하는 모든 숭고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말한다.
“네가 그것이다.”
인간의 원초적 고향, 원시부족사회에서는 삼라만상이 신이었다. 다 신성을 품고 있어, 그 어느 것도 하찮지 않았다. 이게 인간 세상의 원초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문명사회가 되면서 인간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게 되었다.
인간도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다. 대다수 문명인들은 자신이 존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자신 안의 존귀함을 남에게 투사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 근거가 남에게 있게 된다.
남에게 의존하는 인간이 잘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숭배했던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한다. 어떤 작디작은 약점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그를 맹비난하게 된다. “그는 이중인격자야! 위선자야!” 그는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남들을 깎아내려야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사물에 대한 모든 추앙을 멈춰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안의 미덕을 깨워가며 ‘작은 나’를 극복해갔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하여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다. 자존감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다. 이 자존감을 기르는 게 공부다.
자신의 존재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일생동안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다. 현대사회는 돈이라는 유일신을 추앙하는 사회다. 이 신을 향해 우리는 무한경쟁을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계속 자신을 새로이 발명해가는 것, 인간으로 태어난 운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고석근]
수필가
인문학 강사
한국산문 신인상
제6회 민들레문학상 수상.
이메일: ksk21ccc-@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