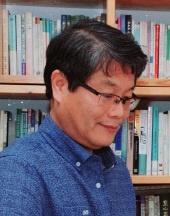
시인의 발목을 잡는 적은 무엇일까? 한자 관념어(개념어)를 꼽을 수 있다. ‘기억, 시간, 인생, 영혼, 욕망, 청춘, 행복’ 등과 같은 한자 관념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제(學制)든 사사(師事)든 정상적으로 시를 수학하면서 오랜 습작기를 보낸 시인이라면 ‘관념어를 배척하라.’ 혹은 ‘한자어를 타파하라’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다. 만일 관념어를 채택하더라도 창작 수법과 시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채택해야 한다. 관념어를 채택했다고 무조건 수준 이하의 시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먼 나라 이론가의 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 안도현 시인이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한겨레출판, 2009)에서 진부한(낡은) 시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강조한 말을 읽어 본다. “당신은 관념적인 한자어가 시에 우아한 품위를 부여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품위는커녕 한자어 어휘 하나가 한 편의 시를 누르는 중압감은 개미의 허리에 돌멩이를 얹는 일과 같다. 신중하고 특별한 어떤 의도 없이 한자 관념어 시어가 시에 들어가 박혀 있으면 그 시는 읽어 보나 마나 낙제 수준이다.”(125쪽)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자 관념어 배척은 시 창작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착안 사항이면서 고려 요소임을 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자 관념어의 심각성을 상기하기 위해 안도현 시인의 말을 더 읽어 본다. “시는 이런 진부한 시어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사유라는 것은 원래 그 속성상 관념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법이다. 하지만 관념을 말하기 위해 관념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학대 행위다.
관념어는 구체적인 실재를 개념화한 언어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관념어는 진부할 뿐 아니라 삶을 왜곡시키고 과장할 수도 있다. 또한, 삶의 알맹이를 찾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껍데기를 어루만지게 한다. 당신의 습작 노트를 수색해 관념어를 색출하라.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체포하여 처단하라.
암세포 같은 관념어를 죽이지 않으면 시가 병들어 죽는다. 상상력을 옥죄고 언어의 잔칫상이어야 할 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관념어를 척결하지 않고 시를 쓴다네, 하고 떠벌이지 마라.”(126쪽)라고 강조했다. 시인이라면 이러한 말들을 뼛속 깊이 새겨 넣어야 함이 합당하다.
시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이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도현 시인의 시 창작법의 일부를 인용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권위에의 호소’이다. 필자보다 인지도가 더 있는 시인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인용했다. 이를 ‘권위에의 호소 오류’ 혹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시인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시적 소양을 의심해 보고, 시를 다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좋은 시는 감동이 깊고, 여운이 길다. 백 명이 읽어도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기 마련이다. 철학은 우주와 자연 현상, 인간과 사회 현상을 개념화하는 반면, 시는 이러한 개념을 감각적 언어와 미적인 언어로 풀어나가야 한다. 철학 용어는 비시적 표현이므로 시적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기용]
문학 박사.
도서출판 이바구, 계간 『문예창작』 발행인.
대구과학대학교 겸임조교수, 가야대학교 강사.
저서 : 평론집 7권, 이론서 2권, 연구서 2권, 시집 5권, 동시집 2권, 산문집 2권, 동화책 1권, 시조집 1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