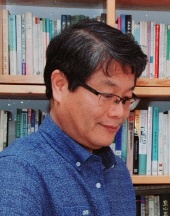
м„ӨлӘ…н•ҳл ӨлҠ” мӢңлҠ” мЈҪмқҖ мӢңлӢӨ. мӢңмқҳ лӮҙмҡ©, мЈјм„қ, мӢңмһ‘ л©”лӘЁлҘј нҶөн•ҙ мӢңлҘј м„ӨлӘ…н•ҳл Өкі н•ҳлҠ” н–үмң„лҠ” мӢ мӨ‘н•ҳкІҢ кІҖнҶ н•ҙм•ј н• л¬ём ңмқҙлӢӨ. мЎ°кёҲ к°•н•ң н‘ңнҳ„мқҙкё°лҠ” н•ҳм§Җл§Ң, вҖҳмӮ¬мЎұмқ„ лӢ¬м•ҳлӢӨл©ҙ л°ңн‘ңн•ҳм§Җ л§җлқјвҖҷл©° к°•мЎ°н•ҙ ліёлӢӨ.
мӮ°л¬ёмӢңмқҳ кІҪмҡ°, мқҙлҜём§Җ н‘ңнҳ„кіј нҳ•мғҒнҷ” к·ё мһҗмІҙк°Җ м„ӨлӘ…мІҳлҹј мқҪнһҲлҠ” кІҪмҡ°к°Җ н—ҲлӢӨн•ҳлӢӨ. мӮ°л¬ёмӢңмқҳ нҳ•нғңмғҒ нҳ№мқҖ мһ‘лІ• мғҒмқҳ нҠ№м„ұмқҙкё°лҸ„ н•ҳлӢӨ. л§Ңмқј м„ӨлӘ…мЎ°мқҳ мӢңн–үмқҙ л§ҺлӢӨл©ҙ мҡҙл¬ём Ғ 진мҲ , лӮҳм•„к°Җ л¬ҳмӮ¬ кё°лІ•мңјлЎң лӢӨл“¬кі лӢӨ듬м–ҙм•ј н•ңлӢӨ.
мЈҪмқҖ мӢңлҘј мқҪмқ„ н•„мҡ”к°Җ мһҲмқ„к№Ң? мЈҪмқҖ мӢңлҘј мқҪкі мӢ¶кұ°л“ вҖҳмӢңмқҳ мЈјкІҖвҖҷмқ„ 묻м–ҙ лҶ“мқҖ вҖҳмӢңмқҳ л¬ҙлҚӨвҖҷм—җм„ңлӮҳ нҢҢн—Өміҗ м°ҫм•„ мқҪм–ҙ ліј мқјмқҙлӢӨ.
мӢңм—җ м„ӨлӘ…мқ„ лҚ§л¶ҷмқј н•„мҡ”к°Җ мһҲмқ„к№Ң? мӢңмқёмқҙ мӢңлҘј м„ӨлӘ…н•ҳл Ө л“Өл©ҙ мҠӨмҠӨлЎң мһ‘н’Ҳм„ұмқ„ нҸ¬кё°н•ҳлҠ” н–үмң„к°Җ лҗҳкі л§ҢлӢӨ. мқҙлҜё л°ңн‘ңн•ң мӢңмқҳ кІ°м җмқ„ н•ҙлӘ…н•ҳл Ө л“Өл©ҙ мҠӨмҠӨлЎң н•Ёлҹү лҜёлӢ¬ мӢңмқёмһ„мқ„ к№Ңл°ңлҰ¬лҠ” 짓мқҙ лҗҳкі л§ҢлӢӨ.
мӢңлҠ” мһҲлҠ” к·ёлҢҖлЎң л‘җм–ҙм•ј к№ҠмқҖ л§ӣмқҙ лӮңлӢӨ. мҳӨлҸ…мқҳ мғҒмғҒл ҘлҸ„ мӢңмқҳ нһҳмқҙлӢӨ. л°ұ мӮ¬лһҢмқҙ мқҪмңјл©ҙ л°ұ к°Җм§Җмқҳ н•ҙм„қмқҙ лӮҳмҷҖм•ј мӢңлӢӨмҡҙ мӢңмқҙлӢӨ. мӢңлқјлҠ” лҶҲмқҙ мғқл¬јкіј к°ҷмқҖ мң кё°мІҙмқҙкё° л•Ңл¬ёмқҙлӢӨ.
нқ”нһҲ мӢңлқјлҠ” лҶҲмқҖ мң кё°мІҙмҷҖ к°ҷмқҖ кІғмқҙлқјм„ң мӮҙм•„м„ң мӣҖм§ҒмқёлӢӨкі л§җн•ңлӢӨ. к·ёл ҮлӢӨ. мӢңлҠ” нғңм–ҙлӮ л•Ңл¶Җн„° к°•н•ң мғқлӘ…л Ҙмқ„ н’Ҳкі нғңм–ҙлӮңлӢӨ. л•ҢлЎңлҠ” мҲңмҲҳм„ұкіј м°ём—¬м„ұ, л•ҢлЎңлҠ” м„ңм •м„ұкіј нҳ„мӢӨм„ұ, л•ҢлЎңлҠ” кіјкұ° нҡҢк·Җм„ұкіј лҜёлһҳ м§Җн–Ҙм„ұ л“ұмқ„ н’Ҳкі нғңм–ҙлӮңлӢӨ.
мӢңмқҳ мғқлӘ…л Ҙмқҙ лҸ…мһҗмқҳ к°ҖмҠҙм—җ л“Өм–ҙк°Җм„ң лҲҲл¬јмғҳмқ„ мһҗк·№н•ҳкё°лҸ„ н•ҳкі , к№ҠмқҖ кіімқ„ н—Өм§‘кі лӢӨлӢҲкё°лҸ„ н•ңлӢӨ. мӢ¬м§Җм–ҙ лЁёлҰҝмҶҚм—җ мҲЁм–ҙл“Өм–ҙ мҳӨлһң нңҙл©ҙмқ„ м·Ён•ҳлӢӨк°Җ м„ёмӣ”мқҙ м§ҖлӮң л’Ө к№Ём–ҙлӮҳ л’ӨнҶөмҲҳлҘј н•ң л°© л•ҢлҰ¬кё°лҸ„ н•ңлӢӨ.
нғңм–ҙлӮ л•Ңл¶Җн„° мҲЁмқҙ л©ҺмқҖ мӢңлқјл©ҙ мң кё°мІҙк°Җ лҗ мҲҳ м—ҶлӢӨ. к·ёкұҙ к·ёлғҘ мЈҪмқҖ мӢңлӢӨ. мӢңмқҳ л¬ҙлҚӨ мҶҚм—җм„ңлӮҳ мқҪм–ҙ ліј мҲҳ мһҲлҠ” мӢңмқҙлӢӨ. лӢ¬лҰ¬ л§җн•ҳл©ҙ, вҖҳлҜёмҷ„мқҳ мӢңвҖҷлҠ” мӢңмһ‘ л…ёнҠёлӮҳ нҢҢмқјм—җм„ң мһ мһҗм•ј н•ңлӢӨ. м„ёмғҒмқҳ л№ӣмқ„ ліҙм§Җ лӘ»н•ҳкІҢ н•ҙм•ј н•ңлӢӨ.
[мӢ кё°мҡ©]
л¬ён•ҷ л°•мӮ¬.
лҸ„м„ңм¶ңнҢҗ мқҙл°”кө¬, кі„к°„ гҖҺл¬ёмҳҲм°Ҫмһ‘гҖҸ л°ңн–үмқё.
лҢҖкө¬кіјн•ҷлҢҖн•ҷкөҗ кІёмһ„мЎ°көҗмҲҳ, к°Җм•јлҢҖн•ҷкөҗ к°•мӮ¬.
м Җм„ң : нҸүлЎ м§‘ 7к¶Ң, мқҙлЎ м„ң 2к¶Ң, м—°кө¬м„ң 2к¶Ң, мӢң집 5к¶Ң,
лҸҷмӢң집 2к¶Ң, мӮ°л¬ём§‘ 2к¶Ң, лҸҷнҷ”мұ… 1к¶Ң, мӢң조집 1к¶Ң л“ұ
мқҙл©”мқј shin1004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