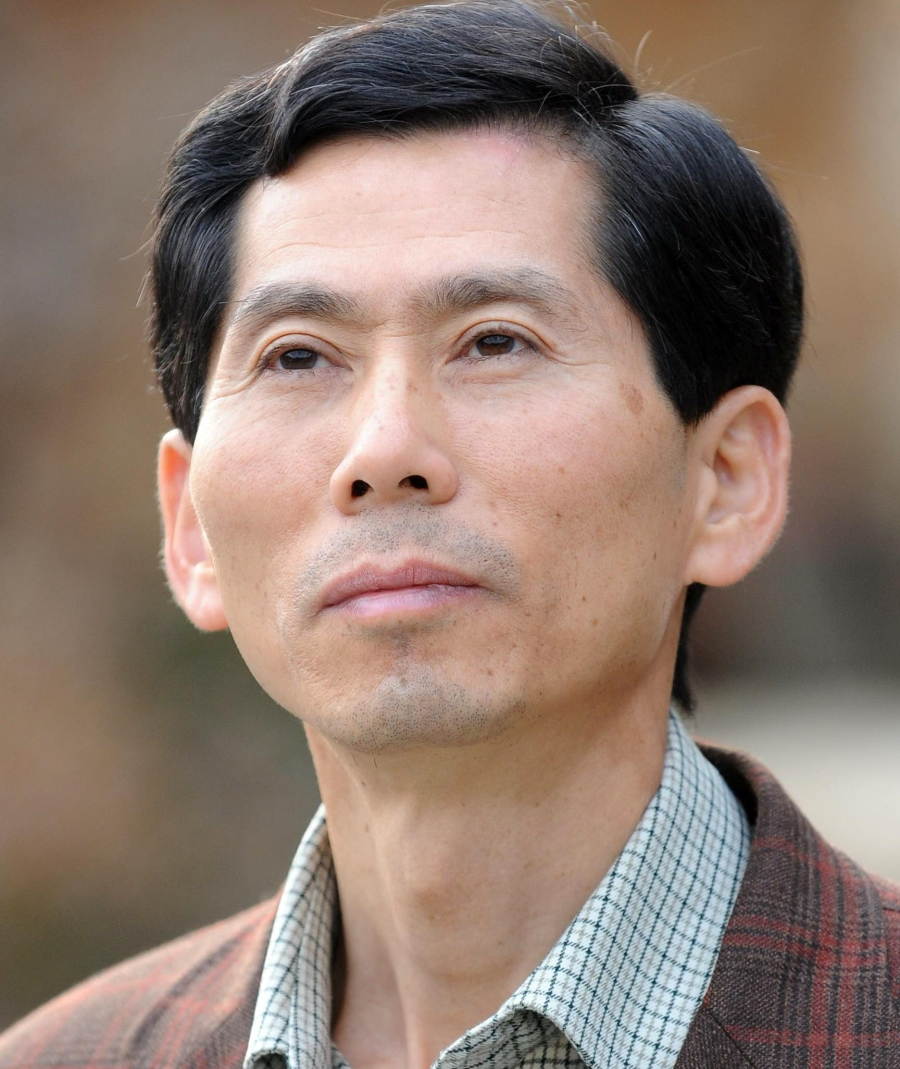
мҠӨмҠӨлЎң лӘ©мҲЁмқ„ лҒҠлҠ” мӮ¬лһҢл“Өмқҳ мӮ¬м—°мқҙ н•ҳлЈЁлҸ„ кұ°лҘҙм§Җ м•Ҡкі л§ӨмҠӨм»ҙм—җ мҳӨлҘҙлӮҙлҰ°лӢӨ. мқҙ л•…мқҳ мһҗмӮҙлҘ мқҖ мһҗк·ёл§Ҳм№ҳ мӢӯ л…„лҸ„ нӣЁм”¬ л„ҳкІҢ OECD көӯк°Җл“Ө к°ҖмҡҙлҚ°м„ң м••лҸ„м Ғ 1мң„лқјлҠ” л¶ҲлӘ…мҳҲлҘј м•Ҳкі мһҲлӢӨ. лӘЁм§„ н•Қл°•мқҳ мӢңкё°мҳҖлҚҳ мқјм ң к°•м җкё°лҘј кұ°м№ҳкі , м—°мқҙм–ҙ 6В·25 н•ңкөӯм „мҹҒмқҳ нҳ№лҸ…н•ң мӢңл Ёмқ„ кІӘмңјл©ҙм„ңлҸ„ лҒҲм§Ҳкё°кІҢ лӘ©мҲЁмқ„ л¶Җм§Җн•ҙ мҳЁ лҜјмЎұмқҙ м•„лӢҲлҚҳк°Җ. к·ёлҹ° мҡ°лҰ¬к°Җ м–ҙм©ҢлӢӨ вҖҳмһҗмӮҙкіөнҷ”көӯвҖҷмқҙлқјлҠ” мҳӨлӘ…жұҡеҗҚмқ„ м–»кІҢ лҗҳм—ҲлҠ”м§Җ, мқјліҖмңјлЎ м•ҲнғҖк№қкі мқјліҖмңјлЎ м„ңкёҖн”Ҳ л§ҲмқҢл§Ҳм Җ л“ лӢӨ.
мЈјм§Җн•ҳлӢӨмӢңн”ј лҢҖн•ңлҜјкөӯмқҖ м§ҖлӮң л°ҳм„ёкё° лҸҷм•Ҳ н•ңк°•мқҳ кё°м ҒмңјлЎң л¶ҲлҰҙ л§ҢнҒј лҲҲл¶ҖмӢ л°ңм „мқ„ мқҙлЈЁм—ҲлӢӨ. н•ҳм§Җл§Ң л№ӣкіј к·ёлҰјмһҗлҠ” м–ём ңлӮҳ кіөмЎҙн•ҳлҠ” лІ•, к·ё мқҙл©ҙм—җлҠ” нҲӯнҲӯ л¶Ҳкұ°м ё лӮҳмҳӨлҠ” л¬ём ңм җл“ӨлҸ„ л§Ңл§Ңм№ҳ м•ҠлӢӨ. к·ё н•ңк°ҖмҡҙлҚ°м—җ мһҗмӮҙмқҙ мһҲлӢӨ. л¬јм§Ҳм Ғ м„ұмһҘм—җ кұёл§һмқҖ м •мӢ м Ғ м„ұмҲҷмқҙ л’Өл”°лқјк°Җм§Җ лӘ»н•ҳлҠ” к°Җм№ҳ м§ҖмІҙнҳ„мғҒмңјлЎң л№ҡм–ҙ진 л¶Ҳн–үн•ң кІ°кіјмқј н„°мқҙлӢӨ.
мқҙлҹ¬н•ң нҳ„мғҒмқҳ л°‘л°”лӢҘм—җлҠ”, м—ӯм„Өм ҒмқҙкІҢлҸ„ 1960л…„лҢҖ мҙҲм—җ мӢңмһ‘лҗң вҖҳмһҳмӮҙм•„ ліҙм„ёвҖҷ мҡҙлҸҷмқҙ лӢЁлӢЁнһҲ н•ңлӘ«мқ„ н•ҳм§Җ м•Ҡм•ҳлӮҳ мӢ¶лӢӨ. кіјм •мқҙм•ј м–ҙм°Ң лҗҳм—Ҳкұҙ н•ңлІҲ мһҳмӮҙм•„ ліҙмһҗлҠ” лӘ©н‘ңлҘј мқҙлЈЁкё° мң„н•ҙ мҲҳлӢЁ л°©лІ•мқ„ к°ҖлҰ¬м§Җ м•Ҡкі лӢ¬л ӨмҳЁ л¶Җмһ‘мҡ©мқј н„°мқҙлӢӨ. м–ҙл–»кІҢ н•ҙм„ң мһҳмӮҙм•„ ліҙл ӨлҠ”к°Җк°Җ м•„лӢҲлқј л¬ҙмЎ°кұҙн•ҳкі мһҳмӮҙм•„ ліҙл ӨлҠ” мӢ¬лҰ¬к°Җ мһҗмӮҙлҘ мқ„ лҶ’мқҙлҠ” кІ°м •м Ғ лҸҷмқёеӢ•еӣ мқҙлқјкі н•ҙлҸ„ к·ёлҰ¬ м§ҖлӮҳм№ң л§җмқҖ м•„лӢҲлқјлҠ” мғқк°ҒмқҙлӢӨ. лҸҲ м•һм—җм„ңлҠ” н”јлҸ„, лҲҲл¬јлҸ„ м—ҶлӢӨ. мӢ¬м§Җм–ҙ лІ”мЈ„мЎ°м°Ё м„ңмҠҙм§Җ м•ҠлҠ”лӢӨ.
мІӯмҶҢл…„л“Өмқ„ лҢҖмғҒмңјлЎң н•ң м–ҙлҠҗ м„Өл¬ё мЎ°мӮ¬лҘј ліҙл©ҙ к°ҖнһҲ 충격м ҒмқҙлӢӨ. вҖңлҸҲ лӘҮмӢӯ м–өмқҙ мғқкё°лҠ” мқјмқҙлқјл©ҙ н•ңл‘җ н•ҙ лҸҷм•Ҳ к°җмҳҘмӮҙмқҙлҘј н•ҙлҸ„ кҙңм°®лӢӨвҖқ к·ё ліҙкі м„ңм—җлҠ” мқҙ м§Ҳл¬ём—җ мғҒлӢ№мҲҳмқҳ мІӯмҶҢл…„мқҙ вҖңк·ёл ҮлӢӨвҖқлқјкі н•ң лӢөліҖмқ„ лӮҙлҶ“м•ҳлӢӨлҠ” кІ°кіјк°Җ лӢҙкІЁ мһҲм—ҲлӢӨ. лҸҲмқҙл©ҙ нҳём Ғм—җ л¶үмқҖ мӨ„мқҙ к·ём–ҙм ёлҸ„ к°ңмқҳм№ҳ м•ҠлҠ”лӢӨлҠ” к·ёл“Өмқҳ мқјк·ёлҹ¬м§„ к°Җм№ҳкҙҖмқ„ ліҙл©ҙм„ң м°ё к°Ҳ лҚ°к№Ңм§Җ к°”кө¬лӮҳ, мӢ¶мқҖ нғ„мӢқмқҙ н„°м ё лӮҳмҳЁлӢӨ. м•„лӢҲ, мқҙкІғмқ„ м–ҙм°Ң к·ёл“Өмқҳ л¬ём ңлЎңл§Ң м№ҳл¶Җн• мқјмқҙкІ лҠ”к°Җ. мҡ°лҰ¬ мӮ¬нҡҢк°Җ к·ёл“Өмқ„ к·ёл ҮкІҢ л§Ңл“ кІғмқҖ м•„лӢҗк№Ң.
мқҙлҘёл°” вҖҳмҲҳм ҖлЎ вҖҷмқҙлқјлҠ” нҳ„мӢӨн’Қмһҗ мқҳмӢқмқҙ мғқкІЁлӮҳ мӮ¬лһҢл“Ө мӮ¬мқҙм—җм„ң нҡҢмһҗлҗҳкі мһҲлӢӨ. л¶ҖлӘЁмқҳ кІҪм ңм Ғ мҲҳмӨҖм—җ л”°лқј л§ӨкІЁм§ҖлҠ” вҖҳкёҲмҲҳм ҖвҖҷлӢҲ вҖҳмқҖмҲҳм ҖвҖҷлӢҲ вҖҳнқҷмҲҳм ҖвҖҷлӢҲ н•ҳлҠ” мӢ мЎ°м–ҙк°Җ мҡ°лҰ¬ мӮ¬нҡҢм—җ кі„мёө к°„мқҳ мң„нҷ”к°җмқ„ мЎ°м„ұн•ҳкі , кёүкё°м•ј мғҒлҢҖм Ғ л°•нғҲк°җмқ„ лӮілҠ”лӢӨ. мқҙм ңлҠ” мӮ¬нҡҢкө¬мЎ°к°Җ кі м°©нҷ”н•ҳм—¬ лҚ” мқҙмғҒ к°ңмІңм—җм„ң мҡ©мқҙ лӮҳкё°лҘј кҝҲкҫёкё° м–ҙл Өмҡҙ мҡ°мҡён•ң м„ёмғҒмңјлЎң л°”лҖҢм–ҙ лІ„л ёлӢӨ.
м ҲлҢҖлӢӨмҲҳмқҳ к°Җм№ҳ кё°мӨҖмқҙ мҳӨлЎңм§Җ кёҲм „мқҳ л§Һкі м ҒмқҢм—җ л§һ추м–ҙм ё мһҲлӢӨ. к·ёлҹ¬лӢӨ ліҙлӢҲ лҸҲмқҙ м—Ҷмңјл©ҙ м Ҳл§қк°җм—җ л№ м§ҖкІҢ лҗҳкі , мқҙлҠ” мһҗмӮҙ 충лҸҷмқ„ л¶ҖлҘёлӢӨ. к·ёлЎң мқён•ҙ нңҙм§Җ лІ„лҰ¬л“Ҝ лӘ©мҲЁмқ„ лҒҠм–ҙлІ„лҰ¬лҠ” мқјмқҙ 비мқјл№„мһ¬н•ҳкІҢ мқјм–ҙлӮңлӢӨ.
л¬ҙлҰҮ л¬ҙмҠЁ мў…көҗмқҙл“ мқёк°„мқҳ лӘЁл“ н–үмң„ к°ҖмҡҙлҚ° к°ҖмһҘ мЈ„м•…мӢңн•ҳлҠ” кІғмқҙ мһҗмӮҙмқҙлӢӨ. к·ё м–ҙл–Ө мқҙмң лЎңлҸ„ мһҗмӮҙмқҖ мҡ©м„ңл°ӣм§Җ лӘ»н• н–үмң„лЎң к°„мЈјн•ңлӢӨ. м§Җкө¬мғҒм—җм„ң мҡ°лҰ¬лӮҳлқјл§ҢнҒј мў…көҗк°Җ лІҲм„ұн•ң кіілҸ„ м•„л§Ҳ м—Ҷм§Җ мӢ¶лӢӨ. к·ёлҹјм—җлҸ„ л¶Ҳкө¬н•ҳкі м§Җкө¬мҙҢмқҳ к·ё м–ҙл–Ө лӮҳлқјліҙлӢӨ 추종мқ„ л¶Ҳн—Ҳн• л§ҢнҒј мһҗмӮҙлҘ мқҙ лҶ’мқҖ нҳ„мғҒмқҖ м°ёмңјлЎң м—ӯм„Өм Ғмқҙ м•„лӢҗ мҲҳ м—ҶлӢӨ. мқҙлЎң лҜёлЈЁм–ҙ ліҙл©ҙ, мқҙ л•…м—җм„ңл§ҢнҒјмқҖ мў…көҗлҸ„ кө¬мӣҗмқҳ м—ӯн• мқ„ н•ҳм§Җ лӘ»н•ңлӢӨлҠ” л°©мҰқмқҙ лҗңлӢӨ.
OECD көӯк°Җл“Ө к°ҖмҡҙлҚ° мӨ‘мӮ°мёөмқҳ кё°мӨҖмқ„ м ңмӢңн•ң мһҗлЈҢк°Җ л°ңн‘ңлҗҳм–ҙ лҲҲкёёмқ„ лҒҲлӢӨ. м„ңкө¬мқҳ м•һм„ м—¬лҹ¬ лӮҳлқјл“Өм—җм„ңлҠ” мӨ‘мӮ°мёөмқҳ кё°мӨҖмңјлЎң, мҷёкөӯм–ҙлҘј н•ҳлӮҳ м •лҸ„ н• мҲҳ мһҲм–ҙм•ј н• кІғ, л¶Җм •кіј л¶ҲлІ•м—җ м Җн•ӯн•ҳл©° лҙүмӮ¬нҷңлҸҷмқ„ кҫёмӨҖнһҲ н• кІғ, м •кё°м ҒмңјлЎң л°ӣм•„ ліҙлҠ” 비нҸүм§Җк°Җ мһҲмқ„ кІғ л“ұмқ„ кјҪлҠ”лӢӨ. л°ҳл©ҙ мҡ°лҰ¬лӮҳлқјмқҳ мӨ‘мӮ°мёө кё°мӨҖмқҖ, л¶Җмұ„ м—ҶлҠ” 30нҸүлҢҖ м•„нҢҢнҠёлҘј мҶҢмң н•ҳкі мһҲмқ„ кІғ, 2,000ccкёүмқҳ мҠ№мҡ©м°ЁлҘј көҙлҰҙ кІғ, н•ң лӢ¬м—җ 500л§Ң мӣҗ мқҙмғҒмқҳ кёүм—¬лҘј л°ӣмқ„ кІғ л“ұмқҙлӢӨ. лӢӨлҘё мҷёкөӯмқҳ м„ м§„көӯл“ӨмқҖ мқҙ кё°мӨҖмқҙ м •мӢ м Ғмқё к°Җм№ҳм—җ л§һ추м–ҙм ё мһҲлҠ”лҚ° мҷң мң лҸ… мҡ°лҰ¬л§Ңмқҙ л¬јм§Ҳм Ғмқё к°Җм№ҳм—җ л§һ추м–ҙм ё мһҲлҠ” кІғмқјк№Ң. м°ёмңјлЎң мІңл°•н•ҳкё°к°Җ мқҙлҘј лҚ° м—Ҷкө¬лӮҳ мӢ¶мқҖ м”Ғм“ён•ң л§ҲмқҢмқ„ л–ЁміҗлІ„лҰҙ мҲҳк°Җ м—ҶлӢӨ.
мЎ°м„ мӢңлҢҖк№Ңм§Җл§Ң н•ҙлҸ„ мқҙл Үм§Җ м•Ҡм•ҳлӢӨ. м„ л№„л“ӨмқҖ 비лЎқ мӮјмҲңкө¬мӢқдёүж—¬д№қйЈҹм—җ нҸҗнҸ¬нҢҢлҰҪејҠиўҚз ҙз¬ м°ЁлҰјмңјлЎң м§ҖлғҲм–ҙлҸ„ мқҳм—°н•Ёмқ„ мһғм§Җ м•Ҡм•ҳкі , лІ”м ‘н• мҲҳ м—ҶлҠ” кё°к°ң н•ҳлӮҳлЎң л°ұм„ұл“Өмқҳ мҡ°лҹ¬лҰ„мқ„ л°ӣм•ҳлӢӨ. к·ёл§ҢнҒј к·ёл•ҢлҠ” м •мӢ м Ғмқё к°Җм№ҳк°Җ мӢңнҚјл ҮкІҢ мӮҙм•„ мһҲм—ҲлӢӨ.
비лҡӨм–ҙ진 мһҗліёмЈјмқҳк°Җ мҡ°лҰ¬ мӮ¬нҡҢлҘј м§Җл°°н•ҳл©ҙм„ң лӘЁл“ кҙҖмӢ¬мӮ¬к°Җ мҳӨлЎңм§Җ лҸҲ, лҸҲ, лҸҲвҖҰвҖҰ, лҸҲ н•ҳлӮҳлЎң мҸ л Ө мһҲлӢӨ. к·ёлҹ¬лӢӨ ліҙлӢҲ лҸҲ м•Ҳ лҗҳлҠ” кІғмқҙл©ҙ м•„мҳҲ кұ°л“Өл– ліј мғқк°Ғмқ„ н•ҳм§Җ м•ҠлҠ”лӢӨ. мұ…мқ„ мқҪкұ°лӮҳ к·ёлҰјмқ„ к°җмғҒн•ҳлҠ” л“ұмқҳ л¬ёнҷ”лҘј н–ҘмҲҳн•ҳлҠ” мқјмқҖ 비мғқмӮ°м Ғмқҙлқј м№ҳл¶Җн•ҙ лІ„лҰ°лӢӨ. көӯлҜј 1мқёлӢ№ м—°к°„ лҸ…м„ңлҹүмқҙ OECD көӯк°Җл“Ө к°ҖмҡҙлҚ°м„ң мөңн•ҳмң„к¶ҢмқҙлқјлҠ” мӮ¬мӢӨмқҙ мқҙлҘј м—¬мӢӨнһҲ мҰқлӘ…н•ҳлҠ” н•ҳлӮҳмқҳ м§Җн‘ңк°Җ лҗңлӢӨ. кІҢлӢӨк°Җ к·ёл§Ҳм ҖлҸ„ лӮ мқҙ к°ҲмҲҳлЎқ л–Ём–ҙм§Җкі мһҲмңјлӢҲ лҚ” л§җн•ҙ л¬ҙм—Ү н• кІғмқёк°Җ.
мһҗмӮҙмқҳ мқёкіјкҙҖкі„лҘј м—ӯ추м Ғн•ҙ ліҙл©ҙ, к·ё к·јліё мӣҗмқёмқҙ м§ҖлӮҳм№ҳкІҢ кІҪлҸ„лҗң л°°кёҲмӮ¬мғҒм—җ лҝҢлҰ¬лҘј л‘җкі мһҲлӢӨлҠ” мғқк°Ғмқҙ л“ лӢӨ. л¬јм§Ҳм Ғмқё н’Қмҡ”лҠ” мғқнҷңмқҳ нҺёлҰ¬лҘј к°Җм ёмҷ”кі , мқҙ мғқнҷңмқҳ нҺёлҰ¬к°Җ л“Өм–ҙм„ң мӮ¬нҡҢм Ғ кҙҖкі„л§қмқ„ лҠҗмҠЁн•ҳкІҢ л§Ңл“Өм—Ҳмңјл©°, к·ёлЎң мқён•ҳм—¬ мғқкІЁлӮң кі лҰҪкіј мҶҢмҷёлЎң мЎ°кёҲмқҙлқјлҸ„ м–ҙл Өмҡҙ мғҒнҷ©м—җ л¶ҖлӢҘм№ҳл©ҙ к·№лӢЁм Ғмқё м„ нғқмқ„ к°җн–үн•ҳкІҢ л§Ңл“ңлҠ” мҲңнҷҳмқҳ кі лҰ¬лҘј нҳ•м„ұн–ҲлӢӨ.
мқҙлҹ¬н•ң нҳ„мғҒмқҳ к·јм Җм—җ л°”лЎң м•һм„ң м–ёкёүн•ң вҖҳмһҳмӮҙм•„ ліҙм„ёвҖҷк°Җ мһҲм§Җ м•Ҡмқ„к№Ң. л¬јлЎ мқҙ л…ёлһ«л§җмқҖ ліёлһҳ вҖҳмҡ°лҰ¬лҸ„ н•ңлІҲ мһҳмӮҙм•„ ліҙм„ёвҖҷмқҙм§Җл§Ң, к·ёкІғмқ„ мҷңкіЎн•ҳм—¬ вҖҳлӮҳлҸ„ н•ңлІҲ мһҳмӮҙм•„ ліҙм„ёвҖҷлЎң л°ӣм•„л“ӨмҳҖмңјлӢҲ, к·ё лҢҖм—ҙм—җ лҒјм§Җ лӘ»н•ҳл©ҙ мғҒлҢҖм Ғ л°•нғҲк°җмңјлЎң кҙҙлЎңмӣҢн•ҳкі кұён•Ҹн•ҳл©ҙ мҠӨмҠӨлЎң лӘ©мҲЁмқ„ лҒҠм–ҙлІ„лҰ¬лҠ” кІғмқј кІҢлӢӨ. лӘЁл“ к°Җм№ҳ кё°мӨҖмқ„ л¬јм§Ҳм—җ л‘җлӢӨ ліҙлӢҲ м •мӢ м Ғ к°Җм№ҳк°Җ н”јнҸҗн•ң ліҙкіје ұжһңлӢӨ. кІ°көӯ, л¬ҙл„Ҳ진 м •мӢ м Ғ к°Җм№ҳмқҳ нҡҢліөл§Ңмқҙ л¶Ҳн–үмқҳ м—°кІ°кі лҰ¬лҘј лҒҠлҠ” кёёмқҙл©° мһҗмӮҙкіөнҷ”көӯмқҙлқјлҠ” мҳӨлӘ…мқ„ м”»мқ„ мҲҳ мһҲлҠ” л°©лҸ„ м•„лӢҗк№Ң.
мқҙлҹ° мғқк°Ғмқ„ н•ҳкі мһҲмңјл ӨлӢҲ л§ҲмқҢ н•ңкө¬м„қмқҙ м°©мһЎн•ҙ진лӢӨ. м•„лӢҲ мҡ°мҡён•ҙ진лӢӨ. м•„лӢҲ, м•„лӢҲ м„ңкёҖнҚјм ё мҳЁлӢӨ.
[кіҪнқҘл ¬]
1991л…„ гҖҠмҲҳн•„л¬ён•ҷгҖӢ, 1999л…„гҖҠлҢҖкө¬л¬ён•ҷгҖӢмңјлЎң л“ұлӢЁ
мҲҳ필집 гҖҺмҡ°мӢңмһҘмқҳ мҳӨнӣ„гҖҸлҘј 비лЎҜн•ҳм—¬ мҙқ 12к¶Ң нҺҙлғ„
көҗмӣҗл¬ён•ҷмғҒ, мӨ‘лҙү мЎ°н—Ңл¬ён•ҷмғҒ, м„ұнҳёл¬ён•ҷмғҒ,
нқ‘кө¬л¬ён•ҷмғҒ, н•ңкөӯлҸҷм„ңл¬ён•ҷ мһ‘н’ҲмғҒ л“ұмқ„ мҲҳмғҒ
н•ңкөӯл¬ёнҷ”мҳҲмҲ мң„мӣҗнҡҢ м°Ҫмһ‘кё°кёҲ л°ӣмқҢ
м ң4нҡҢ мҪ”мҠӨлҜём•ҲмғҒ лҢҖмғҒ мҲҳмғҒ
мқҙл©”мқј kwak-pogo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