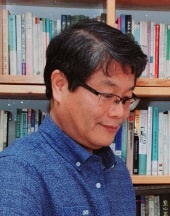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그 유명한 물음표와 느낌표의 일화가 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출판한 후,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출판사에 ‘?’만 표기한 편지를 보냈다. 출판사 발행인은 ‘!’만 표기하여 답장을 보냈다. 전자의 ‘?’는 사람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물음표이다. 후자의 ‘!’는 느낌표이지만, 놀라서 펄쩍 뛸 정도의 반응이라는 뜻으로 답했다는 일화이다. 이 일화는 문장 부호만으로도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시는 글의 예술이다. ‘한글 맞춤법’은 약속이다. 이와 더불어 ‘문장 부호 표기’도 약속이다. 일부 문장 부호(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쌍점 등)의 경우 ‘만국 음성 부호’처럼 만국에서 통용한다.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 구두점은 행과 연을 구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시를 읽을 때 시어(글)만 읽는 것이 아니다. 구두점, 행간, 여백도 읽는다. 리듬, 이미지, 의미도 읽는다. 나아가 호흡도 읽는다.
김춘수 시인은 행과 연을 리듬·이미지·의미의 단락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이에 흔히 호흡 단락을 추가하여 말하기도 한다. 이 호흡 단락이 구두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를 낭독해 보면 호흡과 구두점의 긴밀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은 구두점을 철저히 찍은 듯하다. 모더니스트 김수영 시인도 구두점을 철저히 찍었다. 간혹 생략하더라도 마지막 마침표만은 철저히 찍은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 두 분은 시인이면서 이론가였다. 왜 구두점을 철저히 찍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옛 한글은 줄글이었다. 즉, 띄어쓰기가 없었다. 문장 부호도 오늘날 ‘마침표’와 같은 ‘온점’, ‘쉼표’와 같은 ‘반점’만을 사용하였다. 중요한 것은 구두점을 철저하게 찍었다는 점이다. 줄글이었던 옛시조도 ‘온점’만은 철저하게 찍었음을 『청구영언』을 통해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문장 부호란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부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부록에서는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문장 부호를 통해 문장의 구조와 글쓴이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역설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이를 의도하면서 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마침표의 쓰임은 4가지로 구분한다. 이 글에서 예문은 생략한다. 한국어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부록에 수록한 문장 부호 마침표의 쓰임을 제목 위주로 살펴본다.
①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②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③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④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마침표의 쓰임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첫 번째 쓰임으로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주목해 본다. 시에서 마침표는 단순하게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서 호흡의 종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갈이처럼 리듬·이미지·의미 단락의 단절, 혹은 종지를 의미한다. 시인이 의도하는 리듬·이미지·의미 단락의 종결과 강조이기도 하다.
쉼표의 쓰임은 1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 구체적인 나열은 생략한다. 시에서 쉼표는 단지 휴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 읽기의 들숨 날숨의 숨 고르기 혹은 호흡 조절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시인이 의도하는 리듬·이미지·의미 단락의 분절과 강조이기도 하다.
[신기용]
문학 박사.
도서출판 이바구, 계간 『문예창작』 발행인.
대구과학대학교 겸임조교수, 가야대학교 강사.
저서 : 평론집 7권, 이론서 2권, 연구서 2권, 시집 5권, 동시집 2권, 산문집 2권, 동화책 1권, 시조집 1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