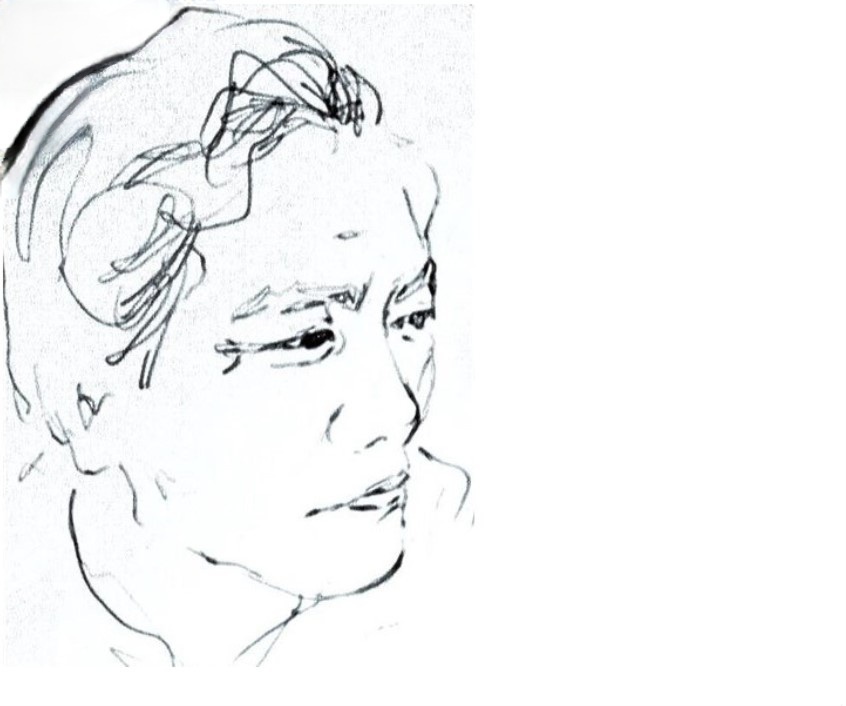
к°Җл № л„Өк°Җ мҳӨнӣ„ 4мӢңм—җ мҳЁлӢӨл©ҙ лӮң 3мӢңл¶Җн„° н–үліөн•ҙм§Җкё° мӢңмһ‘н• кұ°м•ј. мӢңк°„мқҙ м§ҖлӮ мҲҳлЎқ лӮң лҚ” н–үліөн•ҙм§ҖкІ м§Җ. 4мӢңк°Җ лҗҳл©ҙ лІҢмҚЁ лӮң м„Өл Ҳкі м•Ҳм Ҳл¶Җм Ҳ лӘ»н• кұ°м•ј. к·ёлҹ¬л©ҙм„ң н–үліөмқҳ к°Җм№ҳлҘј м•ҢкІҢ лҗҳлҠ” кұ°м§Җ
- м•ҷнҲ¬м•Ҳ л“ң мғқнғқмҘҗнҺҳлҰ¬,гҖҺм–ҙлҰ° мҷ•мһҗгҖҸм—җм„ң
л¬ҙлқјм№ҙлҜё н•ҳлЈЁнӮӨмқҳ мҶҢм„Ө вҖҳмғҒмӢӨмқҳ мӢңлҢҖвҖҷ л§Ҳм§Җл§ү мһҘл©ҙмқҙ кёҙ м—¬мҡҙмқ„ лӮЁкёҙлӢӨ. мЈјмқёкіө мҷҖнғҖлӮҳлІ к°Җ кіөмӨ‘м „нҷ”л¶ҖмҠӨм—җм„ң лҜёлҸ„лҰ¬м—җкІҢ м „нҷ”лҘј кұҙлӢӨ. лҜёлҸ„лҰ¬к°Җ 묻лҠ”лӢӨ.
вҖң мһҗкё°, м§ҖкёҲ м–ҙл”” мһҲлҠ” кұ°м•ј?вҖқ
мҷҖнғҖлӮҳлІ лҠ” мҲңк°„ лӢ№нҷ©н•ңлӢӨ. вҖҳлӮҳлҠ” м§ҖкёҲ м–ҙл””м—җ мһҲлҠ” кІғмқёк°Җ? лӮҳлҠ” м§ҖкёҲ м–ҙл””м—җ мһҲлҠ” кІғмқёк°Җ? к·ёлҹ¬лӮҳ мқҙкіімқҙ м–ҙл””мқём§Җ лӮҳлҠ” м•Ң мҲҳк°Җ м—Ҷм—ҲлӢӨ.вҖҷ к·ёлҹ¬лӢӨ к·ёлҠ” мғқк°Ғн•ңлӢӨ. вҖҳлӮҳлҠ” м–ҙлҠҗ кіілҸ„ м•„лӢҢ мһҘмҶҢмқҳ н•ңк°ҖмҡҙлҚ°м—җм„ң кі„мҶҚ лҜёлҸ„лҰ¬лҘј л¶ҖлҘҙкі мһҲм—ҲлӢӨ.вҖҷ
лҲ„к°Җ мҡ°лҰ¬м—җкІҢ вҖңм–ҙл””м—җ мһҲлҠ”к°Җ?вҖқ н•ҳкі л¬јмңјл©ҙ мҡ°лҰ¬лҠ” лӢөн• мҲҳ мһҲлӢӨ. мӢңк°„кіј кіөк°„мқҳ мӮјм°Ёмӣҗ м„ёкі„м—җ мһҲлҠ” мһҗмӢ мқ„. н•ҳм§Җл§Ң мқҙкІҢ л§һмқ„к№Ң? мӢңк°„кіј кіөк°„мқҳ 축мңјлЎң м •н•ҙм§ҖлҠ” мһҗмӢ мқҳ мң„м№ҳ, мқҙкІғмқҖ н•ҳлӮҳмқҳ вҖҳмӮ¬нҡҢм Ғ н•©мқҳвҖҷм—җ л¶Ҳкіјн•ҳлӢӨ.
м•„мқёмҠҲнғҖмқёмқҳ вҖҳмғҒлҢҖм„ұ мӣҗлҰ¬вҖҷлҠ” мӢңк°„кіј кіөк°„мқҖ мғҒлҢҖм Ғмқҙлқјкі л§җн•ңлӢӨ. мҡ°лҰ¬к°Җ м Җ л©ҖлҰ¬ мһҲлҠ” лі„м—җм„ң лӘҮ мӢңм—җ л§ҢлӮҳмһҗлҠ” м•ҪмҶҚмқҙ к°ҖлҠҘн• к№Ң? м Җ лЁј м°ҪкіөмңјлЎң мҡ°мЈјм„ мқ„ нғҖкі лӮ м•„к°„ мӮ¬лһҢмқҙ м„ңмҡём—җм„ң 1л…„ л’Өм—җ л§ҢлӮҳмһҗлҠ” м•ҪмҶҚмқҙ к°ҖлҠҘн• к№Ң?
к·ёк°Җ 1л…„ л’Өм—җ лҸҢм•„мҳӨкі лӮҳл©ҙ м„ңмҡём—җм„ңлҠ” нӣЁм”¬ л§ҺмқҖ мӢңк°„мқҙ нқҳлҹ¬к°”мқ„ кІғмқҙлӢӨ. мӢңк°„мқҖ мһҘмҶҢм—җ л”°лқј мғҒлҢҖм Ғмқҙкё° л•Ңл¬ёмқҙлӢӨ. мҷҖнғҖлӮҳлІ лҠ” лҜёлҸ„лҰ¬мқҳ м–ҙл””м—җ мһҲлҠҗлғҗлҠ” м§Ҳл¬ём—җ мІҳмқҢм—җлҠ” лӢ№нҷ©н•ҳм§Җл§Ң, мһ мӢң нӣ„ к·ёлҠ” к№ЁлӢ«лҠ”лӢӨ.
вҖҳлӮҳлҠ” м–ҙлҠҗ кіілҸ„ м•„лӢҢ мһҘмҶҢмқҳ н•ңк°ҖмҡҙлҚ°м—җм„ң кі„мҶҚ лҜёлҸ„лҰ¬лҘј л¶ҖлҘҙкі мһҲм—ҲлӢӨ.вҖҷ
м–ҙлҠҗ кіілҸ„ м•„лӢҢ мһҘмҶҢмқҳ н•ң к°ҖмҡҙлҚ°, л°”лЎң вҖҳм§ҖкёҲ м—¬кё°вҖҷлӢӨ. вҖҳм№ҙлҘҙнҺҳ л””м— , нҳ„мһ¬лҘј мһЎм•„лқјвҖҷмқҳ нҳ„мһ¬лӢӨ. мһҗмӢ мқҙ мһҲлҠ” мқҙкіімқҳ нҳ„мһ¬лӢӨ. мҷҖнғҖлӮҳлІ лҠ” лҜёлҸ„лҰ¬к°Җ мӨҖ вҖҳлӮҳлҠ” м–ҙл””м—җ мһҲлҠ”к°Җ?вҖҷмқҳ нҷ”л‘җлҘј лӢЁл°•м—җ н’Җм—ҲлӢӨ. вҖҳм№ҙлҘҙнҺҳ л””м— вҖҷ
мқҙм ң мҷҖнғҖлӮҳлІ лҠ” кіјкұ°мҷҖлҠ” лӢӨлҘё мӮ¶мқ„ мӮҙм•„к°Ҳ кІғмқҙлӢӨ. м§„м •н•ң мӮ¬лһ‘мқ„ н• мҲҳ мһҲкІҢ лҗ кІғмқҙлӢӨ. м§„м •н•ң мӮ¬лһ‘мқҖ мӮ¬л§үмқҳ м—¬мҡ°к°Җ м–ҙлҰ° мҷ•мһҗм—җкІҢ к°ҖлҘҙміҗ мӨҖ мӮ¬лһ‘мқҙлӢӨ.
вҖңк°Җл № л„Өк°Җ мҳӨнӣ„ 4мӢңм—җ мҳЁлӢӨл©ҙ лӮң 3мӢңл¶Җн„° н–үліөн•ҙм§Җкё° мӢңмһ‘н• кұ°м•ј. мӢңк°„мқҙ м§ҖлӮ мҲҳлЎқ лӮң лҚ” н–үліөн•ҙм§ҖкІ м§Җ.вҖқ
мқҙлҹ° мӮ¬лһ‘мқҳ мҲңк°„м—җ, мҡ°лҰ¬лҠ” м№ҙлҘҙнҺҳ л””м— мқ„ м•ҢкІҢ лҗңлӢӨ. вҖҳмҳӨлЎҜмқҙ м§ҖкёҲ м—¬кё°м—җ мһҲлҠ” лӮҳвҖҷлҘј. 비лЎңмҶҢ н–үліөмқҳ к°Җм№ҳлҘј м•ҢкІҢ лҗңлӢӨ. н•ң м„ мӮ¬лҠ” л§җн–ҲлӢӨ. вҖңмҡ°лҰ¬лҠ” м–ҙл””м—җ мһҲкұҙ л•… мң„м—җ мһҲлӢӨ.вҖқ л•… мң„мқҳ м–ҙл””лқјкі мһҗмӢ мқҙ мһҲлҠ” кіімқ„ лӮҳлҲ„лҠ” мҲңк°„, мҡ°лҰ¬лҠ” м§ҖкёҲ м—¬кё°м—җ лЁёл¬јм§Җ лӘ»н•ңлӢӨ.
н•ӯмғҒ м–ҙл”ҳк°ҖлҘј міҗлӢӨліҙкІҢ лҗңлӢӨ. л§үм—°нһҲ л¬ҙм–ёк°ҖлҘј кё°лӢӨлҰ¬кІҢ лҗңлӢӨ. вҖҳкі лҸ„лҘј кё°лӢӨлҰ¬л©°вҖҷ мӮҙм•„к°ҖкІҢ лҗҳлҠ” кІғмқҙлӢӨ. к·№мһ‘к°Җ лІ мјҖнҠёмқҳ нқ¬кіЎ вҖҳкі лҸ„лҘј кё°лӢӨлҰ¬л©°вҖҷлҠ” мӮ¬лһ‘мқ„ мһғм–ҙлІ„лҰ° нҳ„лҢҖмқё, к·ёлһҳм„ң н•ӯмғҒ м•Ҳм Ҳл¶Җм ҲлӘ»н•ҳл©° мӮҙм•„к°ҖлҠ” нҳ„лҢҖмқёмқ„ н’Қмһҗн•ҳкі мһҲлӢӨ.
к·ёлҠ” м§ҖкёҲ м—¬кё°к°Җ л°”лӢҘмқҙлқјкі мғқк°Ғн•ңлӢӨ
лҚ”лҠ” л°Җл Ө лӮҙл Өк°Ҳ кіімқҙ м—ҶмңјлҜҖлЎң
мқҙм ң л°•м°Ёкі мқјм–ҙм„Ө мқјл§Ң лӮЁмқҖ кІғ к°ҷлӢӨ
н•ңл°ӨмӨ‘м—җ к№Ём–ҙлӮҳ м°¬л¬јмқ„ лІҢм»ҘлІҢм»Ҙ л“ӨмқҙнӮӨл©ҙ
л“ӨлҒ“лҠ” м„ёмғҒмқҙ мһ мӢң мӢқмқҖ кІғмІҳлҹј лҠҗк»ҙм§Җкё°лҸ„ н•ҳм§Җл§Ң
к°ҲмҰқмқҖ к·ёлҹ° кІҢ м•„лӢҲлӢӨ
- к°•м—°нҳё, <л°”лӢҘ> л¶Җ분
мҳӨлһҳм „м—җ л“ӨмқҖ мҡ°мҠӨк°ң, вҖҳл°”лӢҘ л°‘м—җ м§Җн•ҳмӢӨмқҙ мһҲлӢӨ.вҖҷ нқ”нһҲ н•ҳлҠ” л§җ, вҖҳл°”лӢҘм—җ л–Ём–ҙм§Җл©ҙ мқҙм ң мҳӨлҘј мқјл§Ң лӮЁм•ҳм–ҙ.вҖҷ кі лҢҖ мӨ‘көӯмқҳ мІ мқё л…ёмһҗмқҳ м§ҖнҳңлӢӨ.
л°”лӢҘм—җ л–Ём–ҙ진 кіөмқҖ мң„лЎң нҠҖм–ҙ мҳӨлҘёлӢӨ. мҡ°лҰ¬лҸ„ кіөмІҳлҹј л¬ҙмӢ¬н•ҳл©ҙ, к·ёлҹ° кё°м Ғмқҙ мқјм–ҙлӮ кІғмқҙлӢӨ.
[кі м„қк·ј]
мҲҳн•„к°Җ
мқёл¬ён•ҷ к°•мӮ¬
н•ңкөӯмӮ°л¬ё мӢ мқёмғҒ
м ң6нҡҢ лҜјл“Өл Ҳл¬ён•ҷмғҒ мҲҳмғҒ.
мқҙл©”мқј: ksk21ccc-@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