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нЦЗлєЫмЭі кЄЄк≤М лИХлКФ мЛЬк∞Д. к∞АмЭДл≥ХмЭА мІІкЄ∞лПД нХШк±∞лЛИмЩА к≥†лЛ®нХЬ л™ЄмЭД мЭЉм∞Н мВ∞лУ±мД±мЧР кЄ∞лМДлЛ§. мҐЕмҐЕк±ЄмЭМмЬЉл°Ь к∞АмЭДмЭА кЄЄмЭД мЮђміЙнХШк≥†, к≤®мЪЄл°Ь нЦ•нХШлКФ мВ∞м≤ЬмЭА нШХмГБмЭі лНФмЪ± мД†мЧ∞нХімІДлЛ§.
к≤®мЪЄмЧР лІИмЭМкїП нХіл≥ік≥† мЛґмЭА мЭЉ л™З к∞АмІАл•Љ лЦ†мШђл¶∞лЛ§. л≠РлЛИ л≠РлЛИ нХілПД л®єлКФ к≤ГмЭілЭЉл©і лИДкµђмЧРк≤МлВШ нЩШмШБл∞ЫмЭД мЭЉ. л™З нХі м†Д к≤®мЪЄмЧР нЪ°мД±кµ∞ мХИнЭ•л©імЭД мІАлВШк∞Д м†БмЭі мЮИлЛ§. м∞љмЧР кєАмЭі мДЬл¶∞ м∞РлєµмІСмЧР лУ§л•імІА л™їнХШк≥† кЈЄлІМ мІАлВШм≥§лЛ§. мХДмЙђмЪі лІИмЭМмЭД лґАмЧђмЮ°к≥† лЛ§мЭМл≤ИмЧФ кЉ≠ лӧ놧мХЉк≤†лЛ§к≥† мГЭк∞БнЦИлЛ§. нХ®л∞ХлИИмЭі нОСнОС мПЯмХДмІАлКФ лВ† м∞љл∞ЦмЭД л≥іл©∞ кєАмЭі л™®лЭљл™®лЭљ мШ§л•ілКФ нМ•мЖМк∞А лУђлњН лЛікЄі м∞РлєµмЭД лСР мЖРмЬЉл°Ь нЧ§л≤Мл¶ђл©∞ м†ХмЛ†мЧЖмЭі л®єлКФ л™®мКµмЭД мГБмГБнХіл≥ЄлЛ§. мІИл¶ђмІА мХКк≥† мЛ§мїЈ лЬѓмЦіл®ємЭД лєµ. мХИнЭ•м∞РлєµмЭілЭЉл©і лСРлІРмЧЖмЭі м†Ьк≤©мЭЉ к≤ГмЭілЛ§.
лЛ§мЭМмЬЉл°Ь лЦ†мШђл¶ђлКФ к≤ГмЭА, мї§лЛ§лЮА м±ЕмГБ мЬДмЧР м±ЕмЭД мЮФлЬ© мМУмХДлЖУк≥† мЭім±Е м†Ам±ЕмЭД лТ§м†БмЭілКФ мЮ•л©імЭілЛ§. мДЄмГБмВђмЧР кіА놮нХЬ мЦілЦ†нХЬ мЧ∞лЭљлПД л∞ЫмІА мХКк≥† м±ЕлНФлѓЄмЧР нММлђїнШАмДЬ мЭілЯ∞м†АлЯ∞ мГЭк∞БмЭД нХіл≥ілКФ к≤Г. мґ•к±∞лВШ лИИмЭі мЩАмДЬ л∞Фкє•мЧР лВШк∞АкЄ∞ мЛЂк±∞лВШ лВШк∞И мИШ мЧЖмЭД лХМ, м±ЕмЭД лІМмІАл©і лІИмЭМмЭі нСЄкЈЉнХімІАлКФ к≤ГмЭА лВШлІМмЭШ лКРлВМмЭЉкєМ.
м±ЕмЭД мЭљлКФ мЮ•мЖМлКФ к∞ЬмЭЄ мДЬмЮђмЧђлПД мҐЛк≥†, к≥µк≥µлПДмДЬкіАмЭімЦілПД кіЬм∞ЃмЭД к≤ГмЭілЛ§. м∞® нХЬ л™®кЄИмЭД л®ЄкЄИк≥† м£Љл≥АмЭД мХДлЮСк≥≥нХШмІА мХКмЬЉл©∞ м±ЕмЭД мЭљмЭД мИШ мЮИлКФ к≤ГмЭі мДЬмЮђмЧРмДЬмЭШ лПЕмДЬлЭЉл©і, мЧђлЯђ мЛ†к∞Д лПДмДЬмЩА мЛЬл¶ђм¶И к∞ДнЦЙлђЉмЭД лСШлЯђл≥іл©∞ лІИмЭМмЧР лУЬлКФ м±ЕмЭД к≥†л•ік≥† лМАмґЬнХі к∞И мИШ мЮИлКФ к≤ГмЭі лПДмДЬкіАмЭД мЭімЪ©нХ† лХМмЭШ мҐЛмЭА м†РмЭілЛ§. к≤МлЛ§к∞А мЪФм¶ШмЭА нЬік≤МмЛЬмД§мЭі лМАм≤іл°Ь мЮШ лПЉ мЮИмЬЉлЛИ мІАмЭЄмЭД лІМлВШ л∞Шк∞Ск≤М мї§нФЉ нХЬ мЮФмЭШ мЧђмЬ†л•Љ к∞Ам†ЄлПД мҐЛмЭД к≤ГмЭілЛ§.
к≤®мЪЄмЧР нХ† лІИмІАлІЙ мЭЉл°ЬлКФ м∞®лґДнХШк≤М мИШмєШл•Љ к≥ДмВ∞нХік∞Ал©∞ мЛ§мГЭнЩЬмЧР мУЄ к∞Акµђ(л™©м†Ьк∞Акµђ)л•Љ лІМлУЬлКФ мЭЉмЭД кЉљмЭД мИШ мЮИлЛ§. м±ЕмЮ•мЭіл©∞, мЮЕмЛЭ мШЈк±ЄмЭі, нЩФлґД л∞Ымє®лМА, мШЈ мИШлВ©лМА лУ±мЭі нПђнХ®лРЬлЛ§. мЮСмЭА л™©к≥µнТИмЭД лІМлУ§лЛ§ л≥ілЛИ мЭілЯ∞ мИШк≥†мК§лЯђмЪі мЮСмЧЕмЧР м∞љм°∞мЭШ кЄ∞мБ®мЭі кєГлУ†лЛ§лКФ к≤ГмЭД мХМк≤М лРРлЛ§. л©ЛмІД мЩЄм†Ь м∞®лВШ нЩФ놧нХЬ мШЈмЭД кµђлІ§нХШмЧђ мЭімЪ©нХШлКФ мВђлЮМмЧРк≤МлКФ кЈЄ лВШл¶ДмЭШ м¶Рк±∞мЫАмЭі мЮИк≤†мІАлІМ, л≤Ик±∞л°≠лНФлЭЉлПД лХА нЭШл¶ђлКФ нИђл∞ХнХЬ мЭЉмЧР лПЩл∞ШнХШлКФ м∞љм°∞м†Б м¶Рк±∞мЫАк≥Љ лВімЮђнХШлКФ нЦЙл≥µмЭі мЮИлЛ§лКФ м†Р лШРнХЬ лВік≤МлКФ мГИл°ЬмЪі л∞Ьк≤ђмЭілЛ§. л™ЄмЭі л∞Фкє•мЧР лВШк∞АмІА мХКк≥† нХЬ к≥≥мЧР мЮИлНФлЭЉлПД, нХ† мИШ мЮИлКФ мЮРмЛ†лІМмЭШ мЭЉмЭД л∞Ьк≤ђнХШлКФ к≤ГмЭА кЈЄлЯ∞ кєМлЛ≠мЧР лІ§мЪ∞ мЭШлѓЄк∞А мЮИлЛ§к≥† мГЭк∞БнХЬлЛ§.
мЦЉлІИ м†Д мЪ∞мЧ∞нЮИлПД мЛЬк≥® мГЭнЩЬмЭД лЛ§л£ђ мЮђлѓЄмЮИлКФ м±Ек≥Љ м°∞мЪ∞нЦИлЛ§. мЛЬк≥® к≥µлПЩм≤ік∞А нХДмЪФл°Ь нХШлКФ к≤ГмЭА вАЬлПИл≥ілЛ§лКФ кЄ∞мИ†вАЭмЭілЭЉлКФ лВімЪ©мЭД лЛік≥† мЮИмЧИлЛ§. м±ЕмЧРлКФ нЩФлНХ, мЖМнШХмИШ놕л∞Ьм†ДкЄ∞, мДЭмґХ мМУкЄ∞ лУ± м†ДмЫРмГЭнЩЬмЧР нХДмЪФнХЬ мЧђлЯђ м†Хл≥імЩА к≤љнЧШмЭі лЛік≤®мЮИмЧИлЛ§. м±ЕмЭШ лВімЪ© м§С к∞АмЮ• лИИкЄЄмЭД лБДлКФ к≤ГмЭА мДЭмґХ мМУкЄ∞мШАлЛ§. кЈЄлЮШмДЬмЭЄмІА м±ЕмЭД мЭљмЬЉл©∞ лУЬлКФ мГЭк∞БмЭА вАЬкЈЄ лІОлНШ мДЭк≥µмЭА мЦілФФл°Ь к∞ФмЭДкєМ?вАЭ нХШлКФ мЭШлђЄмЭімЧИлЛ§. кЈЉлМА мЭінЫДл°ЬлКФ мљШнБђл¶ђнКЄмЭШ м†ДмД±кЄ∞к∞А нЛАл¶ЉмЧЖмЬЉлВШ, мЛЬл©ШнКЄк∞А лМАлЯЙ л≥ікЄЙлРШкЄ∞ мЭім†Д мДЭмґХ(мґХлМА)мЭілВШ лПМлЛі лУ±мЭА м£Љл≥АмЧРмДЬ мЙљк≤М л≥Љ мИШ мЮИлКФ к≤ГлУ§мЭімЧИлЛ§. мЭі м±ЕмЭД нЖµнХі мХМк≤М лРЬ мВђмЛ§мЭА мДЭмґХ мМУлКФ мЭЉмЧР лВімЮђнХЬ к≥µлПЩм≤і мЭШмЛЭк≥Љ нШСлПЩмЛђмЭімЧИлЛ§.
лПМлЛімЭА мХДлђіл†Зк≤МлВШ мМУлКФлЛ§к≥† лРШлКФ к≤ГмЭі мХДлЛИмЧИлЛ§. нХЬ лІИмЭДмЧРмДЬ мДЭмґХмЭД мМУмЭД лХМл©і л®Љм†А мҐЛмЭА лВ†мЭД мЮ°мХДмХЉлІМ нЦИлЛ§. мҐЛмЭА лВ†мЭілЮА, лВ†мФ®к∞А мҐЛмЭА к≤ГлњРлІМ мХДлЛИлЭЉ лПЩлД§ мВђлЮМлУ§мЭі л™®мЭЉ мИШ мЮИлКФ лВ†мЭД мЭШлѓЄнХЬлЛ§. мДЭмґХмЭА нХЬ¬ЈлСР мВђлЮМмЭШ нЮШмЬЉл°ЬлІМ нХ† мИШ мЮИлКФ к≤ГмЭі мХДлЛИмЦімДЬ лІИмЭД мВђлЮМ лЛ§мИШк∞А л™®мЧђ нЮШмЭД л≥інГЬк≥†, л¶ђлНФмЛ≠мЭД к∞ЦмґШ міМмЮ•мЭілВШ мЭімЮ•мЭД м§СмЛђмЬЉл°Ь к≤љнЧШк≥Љ кЄ∞мИ†мЭД к∞ЦмґШ мЮ•мЭЄлУ§мЭШ мІАлПДмЩА м°∞мЦЄмЭі нХДмЪФнЦИлЛ§. м¶Й мЭі мЭЉмЧРлКФ нШСлПЩмЛђк≥Љ кµђмː놕мЭі м†ИлМА нХДмЪФнЦИлЛ§. кµђмː놕мЭА к≥µлПЩм≤іл•Љ мІАнГ±нХШлКФ мЪФмЭЄмЭікЄ∞лПД нХШмІАлІМ, кЄ∞мИ†м†БмЬЉл°ЬлКФ лПМлђілНФкЄ∞к∞А лђілДИмІАмІА мХКлПДл°Э лЛєк≤®м£ЉлКФ м§СмЛђмґХмЭД мЭШлѓЄнХЬлЛ§. лПМ нХШлВШнХШлВШк∞А л∞Фкє•мЬЉл°Ь нЭШлЯђлВШк∞АмІА мХКк≥† мХИм™љ нХШлґАл•Љ мІАнЦ•нХШлПДл°Э нХШлКФ м§СмЛђмД†мЭі мЮИмЦімХЉ нХЬлЛ§.
лПЩлД§ мВђлЮМ м§СмЧРлКФ м†ДлђЄм†Б кЊЉ(мДЭк≥µ)мЭі кљ§ мЮИмЧИмЭД к≤ГмЭілЛ§. кЈЄлУ§мЭА мЮРмЛ†мЭШ лЖНмВђлВШ мІБмЧЕмЧР мҐЕмВђнХШмІАлІМ, мЭі лІИмЭД м†А лІИмЭДмЧРмДЬ мДЭмґХмЭД мМУмЭА мЭЉмЧР лґИ놧к∞Ак±∞лВШ міИм≤≠мЭД л∞ЫмХШмЭД к≤ГмЭілЛ§. к≥µлПЩм≤імЭШ мЭЉмЭікЄ∞мЧР лПИмЭД л∞ЫкЄ∞л≥ілЛ§лКФ мЮРл∞Ьм†БмЬЉл°Ь лХАмЭД нЭШл¶ђк≥† кЈЄ лМАк∞Ал°Ь мЛЬмЫРнХЬ лІЙк±Єл¶ђ нХЬ мВђл∞ЬмЭД лМАм†Сл∞ЫмХШмЭД к≤ГмЭілЛ§. кЈЄлЯђкЄ∞мЧР мЛЬк≥®мЧРмДЬмЭШ мЭЉмЭА лПИл≥ілЛ§лКФ кЄ∞мИ†мЭі лНФ мЬ†мЪ©нХШмШАк≥†, мГБлґАмГБм°∞мЩА нШЄнШЬмЭШ лѓЄлНХмЭі мЮРл¶ђ мЮ°мХШмЭД к≤ГмЭілЛ§. к≥µлПЩм≤імЭШ мЭЉмЭА лПЩлД§ м£ЉлѓЉлУ§мЭШ л™®мЮДмЭД нЖµнХі нХік≤∞нЦИк≥†, мЭіл•Љ нЖµнХі к≥µлПЩм≤і мЭШмЛЭмЭі мЛєнКЄк≥† лСРнД∞мЫМмІАлКФ к≥Љм†ХмЭД к±∞м≥§мЭД к≤ГмЭілЛ§.
мШ§лКШлВ† мЪ∞л¶ђ м£Љл≥А мЦілФФмЧРмДЬлПД м£ЉлѓЉмЭі нХ®кїШ л™®мЧђ мДЭмґХмЭД мМУлКФ л™®мКµмЭД л≥Љ мИШ мЧЖлЛ§. мДЭмґХмЭД мМУлКФ к≥≥мЧРлКФ нХЬ¬ЈлСР лМАмЭШ нПђнБђл†ИмЭЄ кЄ∞мВђк∞А м†Бм†ИнХЬ мЮДкЄИмЭД л∞Ык≥† лІРмЧЖмЭі мЮ•лєДл•Љ мЫАмІБмЭік≥† мЮИлЛ§. кЈЄл¶ђмЪі нТНк≤љмЭі лРШмЦі л≤Дл¶∞ мДЭмґХ мЮСмЧЕ. мДЭк≥µмЭШ мВђлЭЉмІРмЭА к≥µлПЩм≤імЭШ мЩАнХіл°Ь мЭімЦімІДлЛ§. мЭілЯђнХЬ мШИмЧРмДЬ мЪ∞л¶ђлКФ к≥µлПЩм≤імЭШ мЩАнХі мЪФмЭЄмЭД м∞ЊмХДл≥Љ мИШ мЮИлЛ§.
лђЉмІИк≥Љ мЮРл≥ЄмЭД мґФкµђнХШлКФ нЭРл¶ДмЭА мВґмЭШ к∞АмєШ, к≥µлПЩм≤і к∞АмєШмЩАлКФ к±∞л¶ђк∞А л©АкЄ∞ лХМлђЄмЭілЛ§. мХДнММнКЄ мИ≤мЧР к∞ЗнША мЮРмЛ†лІМмЭШ нКЉнКЉнХЬ мЪЄнГАл¶ђл•Љ лСШлЯђмєШк≥† к≥≥к≥≥мЧР CCTVл•Љ мД§мєШнХЬ лПДмЛђмЧРмДЬ нШДлМАмЭЄмЭА мЧ∞лМАл≥ілЛ§лКФ к≥†л¶љмЭД, к≥µлПЩм≤іл≥ілЛ§лКФ к∞ЬмЭЄмЭШ мХИмЬДл•Љ кµђмґХнХ† мИШл∞ЦмЧР мЧЖмІА мХКк≤†лКФк∞А. мЭілЯ∞ мЖНмД±мЭД нММмХЕнХШлКФ к≤ГмЭА лЛ§л•Є нХЬнОЄмЬЉл°Ь мІАл∞©мЖМл©ЄмЧР лМАмЭСнХШк≥† кµђлПДмЛђ мЮђмГЭмЭШ мЛ§лІИл¶ђк∞А лР† мИШлПД мЮИмЭД к≤ГмЭілЛ§.
нХµмЛђмЭА вАШк≥µлПЩм≤і л≥µмЫРвАЩмЭі мХДлЛРкєМ. к≥µлПЩм≤імЭШ к∞АмєШл•Љ мЭЄмЛЭнХШк≥†, к≥µлПЩм≤імЧР кіАнХЬ кіАмЛђмЭД нХ®мЦСнХ† лХМ мІАмЖН к∞АлК•нХЬ лПДмЛЬл∞Ьм†ДмЭі к∞АлК•нХ† к≤ГмЭілЛ§. мШЫ к≥µлПЩм≤і к±імД§мЧР мЮИмЦі м£ЉмЧ≠мЭіл©імДЬ лІРмЧЖмЭі нЧМмЛ†нЦИлНШ мДЭк≥µмЭА мЦілФФмЧР мЮИмЭДкєМ. кЈЄ лІОлНШ мДЭк≥µлУ§мЭА мЦілФФл°Ь к∞ФмЭДкєМ. лєД¬Јл∞ФлЮМмЧР лПМлІИм†АлПД кєОмЧђ лВШк∞АлКФ мДЄмЫФмЭШ лєДм†ХнХ® мЖНмЧР мЬ†нХЬнХЬ мГЭл™ЕмЭД мІАлЛМ мЭЄк∞ДмЭі мШБмЖНнХ† мИШ мЮИк≤†лКФк∞А. мЛЬмЭЄ(л°ЬлєИмК® м†ЬнНЉмК§)мЭА мДЭк≥µмЧРк≤М к≤љмЩЄмЛђмЭД л≥імЭіл©∞, мЛЬк∞ДмЭШ мЮ•кµђнХ®к≥Љ мЦµк≤БмЭШ мДЄмЫФмЭД к≤ђлФФлКФ л∞ФмЬДл•Љ л∞ФлЭЉл≥імІАлІМ, лђімЛђнХЬ мДЄмЫФ мЖНмЧР мШБмЫРнХЬ к≤ГмЭі мЮИк≤†лКФк∞А.
мДЭк≥µмЧРк≤М
лМАл¶ђмДЭмЧР мЛЬк∞ДмЭД мГИкЄ∞л©∞ мЛЄмЪ∞лКФ
нМ®л∞∞к∞А мШИм†ХлРЬ лІЭк∞БмЭШ лПДм†ДмЮРмЭЄ мДЭк≥µлУ§мЭА
лГЙмЖМл•Љ л®єлКФлЛ§. л∞ФмЬДлКФ к∞ИлЭЉмІАк≥†,
мЮ•к≥†мЭШ мДЄмЫФмЭД к≤ђлФФмЦі лєЫл∞ФлЮЬ кЄАмЮРлКФ лґАмДЬм†Є лВіл¶ђл©∞
лєЧлђЉмЧР лЛ≥лКФлЛ§лКФ к≤ГмЭД мХМкЄ∞мЧР.
-л°ЬлєИмК® м†ЬнНЉмК§(Robinson Jeffers), вАШмДЭк≥µмЧРк≤МвАЩ лґАлґД
To the Stone-Cutters
Stone-cutters fighting time with marble, you foredefeated
Challengers of oblivion
Eat cynical earnings, knowing rocks splits, records fall down,
The square-limbed Roman letters
Scale in the thaws, wear in the rain.
кЄИк∞ХмВ∞ м≤Ь кЄЄ лВ≠лЦ†лЯђмІАмЧР мГИк≤®мІД кЄАмЮРл•Љ л≥імХШлЛ§. лЛ®нТН мЬДл°Ь к±∞лМАнХШк≤М лУЬлЯђлВЬ лґЙмЭА кЄАмФ®. м≤Ь кЄЄ лВ≠лЦ†лЯђмІАмЧР л™©мИ®мЭД к±Єк≥†, лІИмЭМмЧРлПД мЧЖлНШ кЄАмЮРл•Љ мГИк≤®мХЉ нЦИлНШ мДЭк≥µмЭД лЦ†мШђл†ЄлЛ§. мДЄмЫФмЭА нЭРл•ік≥† кЈЄ кЄАмЮРл•Љ мГИкЄ∞лНШ мДЭк≥µмЭА мВђлЭЉмІАк≥†, лПЕмЮђмЮРлПД мВђлЭЉм†Єк∞ФлЛ§. нХШмІАлІМ мІІмЭА мИЬк∞Д лґДлЛ®мЭШ л≤љмЭД лДШмЦімДЬ кЈЄм≤ШлЯЉ нЩЬнЩЬ нГАмШ§л•ілНШ лґИмФ®к∞А нХШл£®мХДмє®мЧР мВђкЈЄлЭЉлУ§к≥†, лВ®лґБмЭД мЮЗлНШ лЛ§л¶ђк∞А кЈЄл¶ђ нЧИлІЭнХШк≤М лБКкЄ∞л¶ђлЭЉк≥†лКФ мГЭк∞БнХШмІА л™їнЦИлЛ§. мЮ†мЛЬ л∞ЬмЭД лУ§мЧђлЖУмХШлНШ лґБнХЬ лХЕмЭА лСР л≤И лЛ§мЛЬ л∞Ь лФФлФЬ мИШ мЧЖлКФ к≥µк∞ДмЭі лРШк≥† лІРмХШлЛ§.
лЛ§мЛЬ мГЭк∞БнХіл≥іл©і, лВ®к≥Љ лґБмЭА нХШлВШмЭШ нБ∞ к≥µлПЩм≤імШАлЛ§. нХ®кїШ лІМлУ§к≥† мЧ∞мЧ∞нЮИ мЭімЦік∞АлНШ нХЬк≤®л†И к≥µлПЩм≤ілКФ м†Ьк∞Бк∞БмЬЉл°Ь м°імЖНнХШк≤М лРШмЧИлЛ§. к∞ИлЭЉмІД лСР м™љмЬЉл°ЬлґАнД∞ нХШлВШмЭШ к≥µлПЩм≤іл°ЬмЭШ л≥µмЫРмЭА мЭім†Ь мШБмШБ лґИк∞АлК•нХімІД к≤ГмЭЉкєМ. мДЭк≥µмЭА мВђлЭЉмІАк≥† мІИлђЄмЭА мЭімЦімІДлЛ§.
мІС м£Љл≥Ак≥Љ лПЩлД§мЧР л≥імЭілНШ мДЭк≥µлУ§мЭА лМАм≤і мЦілФФл°Ь к∞ФмЭДкєМ-
кЈЄлУ§мЭі мГЭк∞БлВШлКФ лВ†,
лВ®к≥Љ лґБмЭД мШ§к∞Ал©∞ лМАнХЬлѓЉкµ≠мЭШ лЛік≥Љ мЪЄнГАл¶ђл•Љ нХ®кїШ мМУлКФ мЭЉмЭА мЪ∞л¶ђмЧРк≤М мЦЄм†Ьмѓ§ к∞АлК•нХ†кєМ-
мЪ∞л¶ђмЭШ лЛ§мЭМ мДЄлМАлКФ кЈЄ мЭЉмЭД нХШк≤М лР†кє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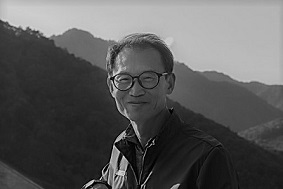
[мЛ†мЧ∞к∞Х]
мЭЄлђЄнХЩ мЮСк∞А
лђЄнХЩ л∞ХмВђ
мЭіл©ФмЭЉ :imilt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