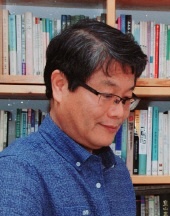
표절은 윤리 문제이다. 윤리라는 잣대는 고무줄일 수 없다.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비윤리적인 표절 행위는 죽은 뒤에도 덮어지지 않는다. 덮을 수도 없고, 덮어질 수도 없다.
2015년 신경숙의 표절 논란으로 말미암아 한국 문단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평단과 언론, 독자들이 문단을 향해 자정 능력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응하고자 한국문인협회는 상설기구 ‘문학표절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고, 한국작가회의는 ‘한국문학의 자기 성찰을 위한 소위원회’라는 독립 기구를 구성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문학 표절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 결과물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했다. 아직도 문단에서는 표절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나아가 수백 년이 지난 옛시조의 표절 의혹도 거론한다. 옛시조는 한시와 중국 고사를 의도적으로 차용하거나 모방하기도 했다. 최초의 사설시조인 정철의 「장진주사(將進酒辭)」, 일명 「한 잔 먹세그려」도 이백과 두보의 시를 모방했다는 것이 문학사적 정설이다. 이를 ‘가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영언’에 수록해 있어 ‘사설시조’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다. 이를 읽어 본다.
한잔 먹세그려 또 한잔 먹세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세그려 /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리 / 어 메어 가나 유소보장(流蘇寶帳)에 만인이 울어 예나 어욱새 속새 떡갈나무 백양 숲에 가기 곳 / 가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파람 불 제 뉘우친들 어쩌리.
― 정철, 「한 잔 먹세그려」 전문
일명 「한 잔 먹세그려」는 술을 권하는 권주가이다. 원제목인 「장진주사(將進酒辭)」에 주목해 본다. 이백의 장진주(將進酒)라는 시의 제목과 내용을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백의 영향을 받은 시조이다. 조선 시대의 시조에는 한시와 중국 고사의 내용을 끌어들이는 일은 자연스러운 창작 기법이었다. 이에 대해 대개 인유, 모방, 영향이라는 유연한 용어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작자에게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먼저 고려말의 이방원과 정몽주가 주고받은 시조를 읽어 본 후, 이에 영향을 받은 시조를 읽어 본다.
이런들 엇떠하리 저런들 엇떠하리
만수산 드렁츩이 얽혀진들 엇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 이방원, 「하여가」 전문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정몽주, 「단심가」 전문
고려 말 이방원은 연회를 열어 정치적 장벽인 정몽주의 마음을 떠봤다. 「하여가」라는 평시조를 통해 떠본 것이다.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했다.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답을 얻은 이방원이 조영규를 시켜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암살했다.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 성삼문, 「이 몸이 죽어 가서」 전문
「이 몸이 죽어 가서」는 사육신 성삼문(1418~1456)이 지은 평시조이다. 정몽주의 「단심가」를 모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문예사조 용어로 말하면 ‘오마주’일 수도 있다. 초장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는 「단심가」의 초장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를 모방한 것이다. 성상문이 이방원에게 굴하지 않은 정몽주의 지조와 절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세조 즉위에 반기를 들었다. 단종 복위를 꾀하다 마흔도 못 미친 나이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 인용 시조에는 그의 지조와 절개가 애절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이직의 시조 「가마귀 검다 하고」와 정몽주 어머니 혹은 김정구의 시조 「가마귀 싸우는 골에」의 영향 관계를 읽어 본다.
가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냐
아마도 겉 희고 속 검을손 너뿐인가 하노라
― 이직, 「가마귀 검다 하고」 전문
「가마귀 검다 하고」는 이직(1362∼1431)이 지은 평시조이다. 이직이 고려 유신의 한 사람이지만, 두 왕조를 섬긴 일을 비웃는 자들에 대해 항변한 시이다. 까마귀와 백로는 흑백을 상징하는 새로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비유할 때 채택하는 소재이다. 백로는 삼은(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과 같은 인물을, 까마귀는 자신의 처지와 같은 인물을 상징하여 비유하였다.
가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가마귀 흰빛을 새올세라
청강에 이껏 씻은 몸 더러일까 하노라
― 정몽주 어머니 혹은 김정구, 「가마귀 싸우는 골에」 전문
「가마귀 싸우는 골에」를 이직의 시조 「가마귀 검다 하고」와 비교해 보면, 까마귀와 백로를 소재로 삼은 것은 같으나 내용은 다르다. 이직은 역성혁명과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편에 가담한 공신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항변이다. 정몽주의 어머니는 단종 복위를 꾀하면서 이방원을 부정하던 아들에게 모정을 담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가마귀 싸우는 골에」는 『청구영언』 380에도 수록되어 있다. 『진본 청구영언』(삼합인쇄소, 1957)에 “대개 작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나 『가곡원류』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或曰鄭夢周母親爲圃隱赴太宗宴時作’ 그러나 이설(異說)을 따라 『약파만록』에 적힌 단가의 내용이 이것과 비슷한 것에 의하여 김정구 작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라고 주석이 달려 있다. 실제 『가곡원류』(조선문화관, 1946) 5면에 ‘或曰鄭夢周母親爲圃隱赴太宗宴時作’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신영철의 『고시조신역』 37면에 태종 탄생 전에 정몽주 모친이 별세했다.’라는 주석도 달려 있다. 이를 고려해 보면, 김정구 작이 유력하다. “책에 따라 ‘새올세라’가 ‘새오나니’, ‘청파’가 ‘청강’, ‘이껏’이 ‘조히’로 시어가 약간 다르게 표기되어 전한다.
이향아의 『시의 이론과 실제』(청아출판사, 1993)에서는 이 시조를 언어적 아이러니의 한 형식인 ‘패러디’로 보았다. 이 패러디는 언어유희의 한 형식으로서 이직의 시조를 개작했음을 암시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시조 한 편을 두고 작자가 다르게 전해져 오는 시조가 또 있다. 이를 읽어 본다.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맡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십 년을 경영하여」 전문
「십 년을 경영하여」는 김장생(1548~1631)의 작품이라는 설, 송순(1493~1583)의 작품이라는 설이 있다. 최일환은 청송부(을지출판공사, 1992)에서 『병와가곡집』 177에는 김장생의 작품으로, 송순의 문집 『면앙집』 4권에는 한역(漢譯)으로 송순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청구영언』 370에도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진본 청구영언』(삼합인쇄소, 1957)에는 “중종 시인 송순 혹은 김장생이 작자로 된 데도 있다.”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송순이 김장생보다 반세기 정도 앞서 살다 갔다. 그렇다면 김장생이 송순의 시조를 모방 혹은 표절했거나, 후대에서 『병와가곡집』을 엮을 때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1981년 시조단에서 김장생 작이라 주장하는 경철과 송순 작이라 주장하는 최일환이 ‘한국시조시인협회 세미나’와 《시조문학》 지면을 통해 몇 차례 논박하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장생이든 송순이든 문제는 둘 다 고전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결론 날 문제가 아니다. 만일 송순 작이라 결론이 난다면 김장생이 표절한 꼴이 된다. 반면에 김장생 작이라 결론이 나면 『병와가곡집』의 오류가 이것만이 아닐 것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양쪽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표절 의혹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거론된다. 표절 의혹의 생명력과 끈질김을 알아야 한다. 표절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죽어서도 고이 잠들 수 없는 일이다. 작가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거론할 수밖에 없고,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후회할 일만은 만들지 말자.
[신기용]
문학 박사.
도서출판 이바구, 계간 『문예창작』 발행인.
대구과학대학교 겸임조교수, 가야대학교 강사.
저서 : 평론집 7권, 이론서 2권, 연구서 2권, 시집 5권,
동시집 2권, 산문집 2권, 동화책 1권, 시조집 1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