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ҖңмҳӨлҠҳмқҖ мү¬лҠ” лӮ мқҙм•ј.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ҙмһ–м•„.вҖқ
л§җмқҖ к·ёл ҮкІҢ н•ҳм§Җл§Ң, к·ё л§җ мҶҚм—җ мҷ м§Җ лӘЁлҘј кәјлҰјм№ҷн•ң 기분мқҙ л“Өм—Ҳмқ„ кІғмқҙлӢӨ. мҷңмқјк№Ң?
нҺёмқҳм җ м•„лҘҙл°”мқҙнҠёмғқмқҖ м—¬м „нһҲ мғҲлІҪ м¶ңк·јмқ„ мӨҖ비н•ҳкі , л°°лӢ¬ м•ұм—җлҠ” мҳӨм „л¶Җн„° нҳём¶ңмқҙ мҸҹ아진лӢӨ. лҲ„кө°к°ҖлҠ” мң кёүнңҙмқјмқ„ л°ӣкі , лҲ„кө°к°ҖлҠ” л¬ҙкёүл…ёлҸҷм—җ мӢңлӢ¬лҰ°лӢӨ.
н•ңкөӯ мӮ¬нҡҢм—җм„ң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Җ вҖҳкіөнңҙмқјвҖҷмқҙлқјкё°ліҙлӢӨлҠ” лҲ„кө°к°Җм—җкІҢл§Ң н—ҲлқҪлҗң вҖҳнҠ№к¶ҢвҖҷмқҳ лӮ мІҳлҹј лҠҗк»ҙ진лӢӨ. 축н•ҳл°ӣлҠ” лӮ мқёлҚ° мҷң л¶ҲнҺён• к№Ң? мү¬лҠ” лӮ мқёлҚ° мҷң мЈ„мұ…к°җмқҙ л“Өк№Ң? к·ёлӮ мқҳ 진м§ң мқҳлҜёк°Җ нқҗл ӨмЎҢкё° л•Ңл¬ёмқҙлӢӨ. мҡ°лҰ¬лҠ” мқҙ лӮ мқ„ лӢЁмҲңнһҲ вҖҳл…ёлҸҷмһҗмқҳ нңҙмқјвҖҷлЎңл§Ң л°ӣм•„л“Өмқҙкё°ліҙлӢӨ, к·ё мқҙл©ҙм—җ лӢҙкёҙ кө¬мЎ°м Ғ л¶ҲнҸүл“ұкіј мҷңкіЎлҗң л…ёлҸҷ мқёмӢқмқ„ м§Ғл©ҙн•ҙм•ј н•ңлӢ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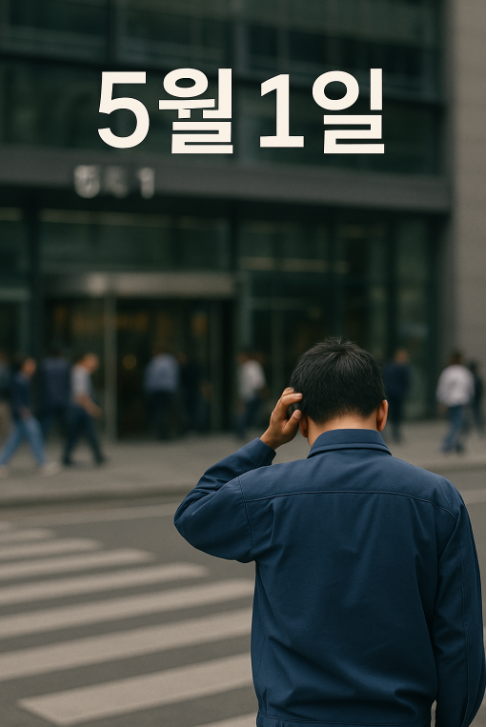
мһҠнҳҖ진 мҷём№Ёмқҳ лӮ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Җ лӢЁм§Җ кіөнңҙмқјмқҙ м•„лӢҲлӢӨ. к·ё лҝҢлҰ¬лҠ” 1886л…„ лҜёкөӯ мӢңм№ҙкі м—җм„ң лІҢм–ҙ진 'н•ҳмқҙл§Ҳмј“ л…ёлҸҷмһҗ нҲ¬мҹҒ'к№Ңм§Җ кұ°мҠ¬лҹ¬ мҳ¬лқјк°„лӢӨ. 8мӢңк°„ л…ёлҸҷм ңлҘј мҷём№ҳлҚҳ л…ёлҸҷмһҗл“Өмқҳ мҙқнҢҢм—…мқҖ н”јлЎң м–јлЈ©мЎҢкі , к·ё нқ¬мғқмқ„ кё°лҰ¬л©° 5мӣ” 1мқјмқҖ м„ёкі„ л…ёлҸҷмһҗл“Өмқҳ нҲ¬мҹҒкіј м—°лҢҖмқҳ мғҒ징мқҙ лҗҳм—ҲлӢӨ.
н•ңкөӯм—җм„ңлҸ„ 1923л…„ мІҳмқҢмңјлЎң вҖҳл…ёлҸҷм ҲвҖҷмқҙ м—ҙл ём§Җл§Ң, мқјм ң к°•м җкё°мҷҖ кө°мӮ¬м •к¶Ңмқ„ кұ°м№ҳл©° к·ё м •мӢ мқҖ мҳӨлһң мӢңк°„ м–өм••лӢ№н–ҲлӢӨ. 1994л…„м—җм•ј вҖҳк·јлЎңмһҗмқҳ лӮ вҖҷлЎң лІ•м ңнҷ”лҗҳм—Ҳм§Җл§Ң, вҖҳл…ёлҸҷмһҗвҖҷк°Җ м•„лӢҢ вҖҳк·јлЎңмһҗвҖҷлқјлҠ” лӢЁм–ҙ м„ нғқл¶Җн„° лӢ№мӢң м •к¶Ңмқҳ м •м№ҳм Ғ мқҳлҸ„к°Җ лӢҙкІЁ мһҲм—ҲлӢӨ.
лӢЁмҲңн•ң мҡ©м–ҙ м°ЁмқҙмІҳлҹј ліҙмқҙм§Җл§Ң, вҖҳк·јлЎңвҖҷлҠ” мқјмқ„ мӢңнӮӨлҠ” мӘҪкіјмқҳ кҙҖкі„лҘј м „м ңлЎң н•ң н‘ңнҳ„мқҙкі , вҖҳл…ёлҸҷвҖҷмқҖ мқёк°„ мӮ¶мқҳ ліём§Ҳм Ғмқё нҷңлҸҷмқ„ к°ҖлҰ¬нӮЁлӢӨ. мқҙ мһ‘мқҖ м–ём–ҙмқҳ м°Ёмқҙ мҶҚм—җ л…ёлҸҷмқҳ к°Җм№ҳк°Җ мҳӨлһ«лҸҷм•Ҳ м–ҙл–»кІҢ мҷңкіЎлҗҳм–ҙ мҷ”лҠ”м§ҖлҘј м•Ң мҲҳ мһҲлӢӨ.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Җ лҲ„кө¬мқҳ лӮ мқёк°Җ?
мқҙ лӮ мқҙ лӘЁл‘җм—җкІҢ лҸҷмқјн•ң мқҳлҜёлЎң лӢӨк°ҖмҳӨм§Җ м•ҠлҠ” мқҙмң лҠ” лӢЁмҲңн•ҳлӢӨ. н•ңкөӯмқҳ л…ёлҸҷ нҳ„мӢӨмқҖ вҖҳмқҙмӨ‘кө¬мЎ°вҖҷм—җ к°Җк№қкё° л•Ңл¬ёмқҙлӢӨ. м •к·ңм§Ғкіј л№„м •к·ңм§Ғ, лҢҖкё°м—…кіј н•ҳмІӯ, мӮ¬л¬ҙм§Ғкіј н”Ңлһ«нҸј л…ёлҸҷмһҗ мӮ¬мқҙмқҳ кІ©м°ЁлҠ” м—¬м „нһҲ нҒ¬лӢӨ.
нҶөкі„мІӯ мһҗлЈҢм—җ л”°лҘҙл©ҙ, 2024л…„ кё°мӨҖ м „мІҙ м·Ём—…мһҗ мӨ‘ м•Ҫ 35%к°Җ л№„м •к·ңм§ҒмқҙлӢӨ. мқҙл“ӨмқҖ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Ў°м°Ё лІ•м ҒмңјлЎң мң кёүнңҙмқј ліҙмһҘмқ„ л°ӣм§Җ лӘ»н•ңлӢӨ. л°°лӢ¬кё°мӮ¬, нғқл°° л…ёлҸҷмһҗ, мҡ”м–‘ліҙнҳёмӮ¬, к°ҖмӮ¬лҸ„мҡ°лҜёмІҳлҹј лІ•м Ғ вҖҳк·јлЎңмһҗвҖҷ м§Җмң„мЎ°м°Ё м• л§Өн•ң м§Ғкө°мқҖ мқҙ лӮ кіј мӮ¬мӢӨмғҒ л¬ҙкҙҖн•ҳлӢӨ.
н”Ңлһ«нҸј л…ёлҸҷмһҗл“ӨмқҖ к°ңмқёмӮ¬м—…мһҗлқјлҠ” лӘ…лӘ© м•„лһҳ к·јлЎңмһҗлЎңм„ңмқҳ ліҙнҳё мһҘм№ҳм—җм„ң лІ—м–ҙлӮҳ мһҲлӢӨ. 5мӣ” 1мқј н•ҳлЈЁ мү¬лҠ” кІғмқҖ к·ёл“Өм—җкІҢ лӢЁм§Җ л§Өм¶ң мҶҗмӢӨлЎң лӢӨк°Җмҳ¬ лҝҗмқҙлӢӨ.
кІҢлӢӨк°Җ, кё°м—…л§ҲлӢӨ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 мң кёүнңҙмқјлЎң м§Җм •н•ҳлҠ” кІғлҸ„ мһҗмңЁм—җ л§ЎкІЁм ё мһҲм–ҙ мӢӨм ңлЎң мүҙ мҲҳ мһҲлҠ” мӮ¬лһҢмқҖ лҢҖмІҙлЎң лҢҖкё°м—… мӮ¬л¬ҙм§Ғм—җ көӯн•ңлҗңлӢӨ. кІ°көӯ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Җ м•„мқҙлҹ¬лӢҲн•ҳкІҢлҸ„ 'мқјмқ„ кі„мҶҚн•ҙм•јл§Ң н•ҳлҠ” мӮ¬лһҢл“Ө'м—җкІҢ к°ҖмһҘ мҶҢмҷёлҗң лӮ мқҙ лҗҳкі мһҲлӢӨ.
мҷң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Җ мқҙнҶ лЎқ 분м—ҙм Ғмқёк°Җ? к·ё мқҙмң лҠ” л…ёлҸҷ мһҗмІҙм—җ лҢҖн•ң мқёмӢқмқҙ мӮ¬нҡҢм ҒмңјлЎң лӢЁмқјн•ҳм§Җ м•Ҡкё° л•Ңл¬ёмқҙлӢӨ.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Җ лӢЁм§Җ н•ҳлЈЁ мү¬лҠ” лӮ мқҙ м•„лӢҲлқј, вҖҳл…ёлҸҷмқҙ мЎҙмӨ‘л°ӣлҠ” мӮ¬нҡҢвҖҷлҘј мң„н•ң мғҒ징м Ғ м„ м–ёмқҙ лҗҳм–ҙм•ј н•ңлӢӨ. н•ҳм§Җл§Ң м§ҖкёҲмқҳ м ңлҸ„лҠ” к·ёкІғмқ„ л°©н•ҙн•ңлӢӨ.
л…ёлҸҷмһҗм—җкІҢ мң кёүнңҙмқјмқ„ м ңкіөн• лІ•м Ғ мқҳл¬ҙк°Җ м—ҶлӢӨлҠ” м җ, мһҗмҳҒм—…мһҗлӮҳ н”Ңлһ«нҸј мў…мӮ¬мһҗлҠ” к·ё лІ”мЈјм—җ нҸ¬н•Ёлҗҳм§Җ м•ҠлҠ”лӢӨлҠ” м җ, л…ёлҸҷмЎ°н•©м—җ к°Җмһ…н• к¶ҢлҰ¬лҘј лҲ„лҰ¬м§Җ лӘ»н•ҳлҠ” мқҙл“Өмқҙ л„Ҳл¬ҙлӮҳ л§ҺлӢӨлҠ” м җ. мқҙ лӘЁл“ кІғмқҙ лӢЁ н•ҳлЈЁ,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ҳ л¬ҙкІҢлҘј лҚ”мҡұ л¬ҙкІҒкІҢ л§Ңл“ лӢӨ.
OECD мһҗлЈҢм—җ л”°лҘҙл©ҙ, н•ңкөӯмқҖ л…ёлҸҷмӢңк°„мқҙ к°ҖмһҘ кёҙ лӮҳлқј мӨ‘ н•ҳлӮҳлӢӨ. к·ёлҹ¬лӮҳ л…ёлҸҷмӢңк°„мқҙ кёёлӢӨкі н•ҙм„ң мһҗлҸҷмңјлЎң вҖҳл…ёлҸҷ мЎҙмӨ‘вҖҷмңјлЎң мқҙм–ҙм§Җм§ҖлҠ” м•ҠлҠ”лӢӨ.
ліҙмғҒмқҙ м—Ҷкі , мЎҙмӨ‘лҸ„ м—Ҷкі , кө¬мЎ°м Ғ м°Ёлі„л§Ң м§ҖмҶҚлҗңлӢӨл©ҙ,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Җ м•„мқҙлҹ¬лӢҲн•ҳкІҢлҸ„ вҖҳн”јлЎңмқҳ лӮ вҖҷ нҳ№мқҖ вҖҳл¶ҲнҸүл“ұмқ„ мІҙк°җн•ҳлҠ” лӮ вҖҷмқҙ лҗҳм–ҙлІ„лҰ°лӢӨ.
кё°л…җмқјмқҙ м•„лӢҢ н–үлҸҷмқҳ лӮ лЎң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Җ лӢЁм§Җ вҖҳмү¬лҠ” лӮ вҖҷмқҙм–ҙм„ м•Ҳ лҗңлӢӨ. к·ёкІғмқҖ кё°л…җмқјмқҙ м•„лӢҲлқј н–үлҸҷмқҳ лӮ мқҙм–ҙм•ј н•ңлӢӨ. лӢЁ н•ҳлЈЁмқҳ нңҙмӢқмқҙ лӘЁл‘җм—җкІҢ нҸүл“ұн•ҳкІҢ лӢӨк°ҖмҳӨлҠ” м„ёмғҒмқҖ м•„м§Ғ лҸ„лһҳн•ҳм§Җ м•Ҡм•ҳлӢӨ. 진м§ң мқҳлҜёлҘј лҗҳм°ҫкё° мң„н•ҙ н•„мҡ”н•ң кІғмқҖ лӢЁмҲңн•ң м„ м–ёмқҙ м•„лӢҲлқј, м ңлҸ„ к°ңнҺёкіј мқёмӢқмқҳ ліҖнҷ”лӢӨ.
л…ёлҸҷк¶Ң мӮ¬к°Ғм§ҖлҢҖлҘј м—Ҷм• лҠ” лІ•м Ғ ліҙмҷ„, н”Ңлһ«нҸј л…ёлҸҷмһҗмқҳ к¶ҢлҰ¬ мқём •, л№„м •к·ңм§Ғмқҳ кі мҡ© м•Ҳм •м„ұ нҷ•ліҙ. мқҙлҹ¬н•ң ліҖнҷ” м—Ҷмқҙ к·јлЎңмһҗмқҳ лӮ мқ„ л…јн•ҳлҠ” кІғмқҖ кіөн—Ҳн•ҳлӢӨ. мҳӨлҠҳ н•ҳлЈЁмҜӨмқҖ мҡ°лҰ¬к°Җ лҲ„лҰ¬лҠ” мқҙ нңҙмӢқмқҙ лҲ„кө°к°Җм—җкІҢлҠ” н—ҲлқҪлҗҳм§Җ м•ҠмқҖ нҠ№к¶Ңмқј мҲҳ мһҲлӢӨлҠ” м җмқ„ лҸҢм•„ліј н•„мҡ”к°Җ мһҲлӢӨ.
[м№јлҹј-мқҙнғқнҳё кё°мӮ¬ м ңкіө]
м№јлҹјлӢҲмҠӨнҠё
мҲҳмӣҗлҢҖн•ҷкөҗ көҗмҲҳ, кІҪмҳҒн•ҷл°•мӮ¬
(мӮ¬)н•ңкөӯкІҪмҳҒл¬ёнҷ”м—°кө¬мӣҗ мӣҗмһҘ
мһҘмҲҳкё°м—… м „л¬ёк°Җ
ліҖнҷ”мҷҖ нҳҒмӢ л°Ҹ лҰ¬лҚ”мқҳ м—ӯлҹүк°•нҷ” м „л¬ёк°Җ
вҖңмЈҪкё°м „м—җ лҚ” лҠҰкё°м „м—җ кјӯ н•ҙм•ј н• 42к°Җм§Җ" м Җмһҗ
